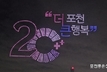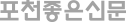필자 석인호.
그때였다. 조금 안쪽에 타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쁘지 않으니 내렸다가 다음번에 타야겠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할머니에게 쏠렸다.
키는 작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에다 가볍게 웨이브 진 흰 머리카락이
뭔가 모를 기품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문 쪽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비집고 내리셨다.
그 사이 그 아가씨와 문 쪽에 섰던 청년 둘이 잠깐 내렸다가 냉큼 다시 올라탔다.
나는 속으로 ‘뭐 이런 맹랑한 애들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문이 닫히고 승강기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서 정말 예의를 모르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의 얼굴 가죽 두께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우 없음에 놀랐다. 아무리 급하게 열차를 타야 할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 여자를 보니 6년 전 10월 어느 날 똑같은 일을 겪고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이 생각났다. 그 때에 썼던 글을 전재해 며칠 전의 심정을 밝히고 싶다. 다음 글의 상황과 며칠 전의 상황이 똑같이 닮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하철을 탈 때 나는 노약자용 승강기를 곧잘 이용한다. 지상에서 곧바로 지하철 개찰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지난해부터 경로우대를 받아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70세도 안 된 내가 이 승강기를 타기엔 좀 낯간지럽게 느껴졌다.
승강기 밖이나 안쪽 벽에는 ‘이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분들에게 먼저 양보합시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곧 바뀌고 말았다. 대부분의 노약자용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 한 현상들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이 깊거나 환승객이 많은 곳일수록 더 심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시청역은 항상 인파로 넘쳐난다. 또 오가는 사림들의 발걸음들도 모두가 빠르다. 그만큼 바쁘게 일하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역 승강기에는 항상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로 만원이다. 바로 옆에 계단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승강기를 많이 이용한다.
모두 두 줄로 서서 기다리다 순서대로 타는 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양보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어 씁쓸하다. 심지어 휠체어에 탄 사람이 뒤에 있어도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먼저 타는 젊은이들이 있다.
언젠가는 이 역 승강기 문이 닫히려 할 때 다시 열고 들어온 예쁘장한 아가씨가 있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들을 위해 문이 자동으로 일정 시간 지나야 닫히게 돼 있다. 그렇지만 열림 스위치를 누를 때는 잽싸게 열린다. 그리고 한 번 열린 후에는 다시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닫힘 스위치는 아예 작동이 안 되게 돼 있다.
이 승강기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역에 비해 많은 인원이 탈 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탄 후에 ‘삑 삑’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닫히지가 않았다. 승선 인원을 초과했다는 신호음이다. 그런데도 이 아가씨는 내릴 생각을 않고 버틴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있었다.
모두가 순하고 착해서 그러는지 귀찮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마침 안쪽에 타고 있어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잠자코 있었다. 그렇지만 내심으론 그 아가씨에게 ‘어서 내리라’라고 크게 호통쳐주고 싶었다.

작품명 '석양'. 사진작가 박순희 作. 궁평항에서 촬영.
그때였다. 조금 안쪽에 타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쁘지 않으니 내렸다가 다음번에 타야겠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할머니에게 쏠렸다. 키는 작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에다 가볍게 웨이브 진 흰 머리카락이 뭔가 모를 기품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문 쪽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비집고 내리셨다. 그 사이 그 아가씨와 문 쪽에 섰던 청년 둘이 잠깐 내렸다가 냉큼 다시 올라탔다. 나는 속으로 ‘뭐 이런 맹랑한 애들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문이 닫히고 승강기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영 개운하지가 않았다. 마지막에 탔던 그 못된 계집아이를 불러 단단히 혼을 내주었으면 직성이 풀렸을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해 한바탕 퍼부었다면 마음이 시원했을까. 자진해서 먼저 내린 그 단아한 할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워졌다. 참 아름다운 노후의 모습이란 생각도 들었다. 나도 그렇게 우아한 모습과 행동으로 늙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자주 이용하는 신금호역은 열차를 타는 플랫폼이 무척 깊다. 지상에서 4층 정도 되는 깊이를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내려가야 승차를 위한 개찰을 할 수 있다. 개찰을 하고 나면 다시 나란히 설치된 두 대의 엘리베이터 중 하나를 타고 내려가야 플랫폼에 닿는다. 이 엘리베이터들은 8층 깊이를 오르내린다.
그날 내가 탔던 엘리베이터도 만원 상태였다. 닫히려는 문을 열고 마지막에 탄 그 여자는 승차 인원 초과를 알리는 경고음을 듣고도 끝까지 안 내렸다. 결국 입구에 있던 50대쯤 돼 보이는 건장한 50대 남자가 내리고 말았다. 표현하기 힘든 표정을 지으며 내리던 그 남자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