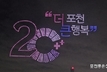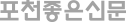모름지기 사람에게는 사람값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는 어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른 값도 있지 않겠는가.
어른이기가 버거운 까닭은 그 어른값을 다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아닐까.
그 때문에 '어쩌다 어른'임을 겁내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날 때 방송 프로를 돌리다 보니 한 번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 유념해 본 일이 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공개방송 형식의 1인 토크 프로다.
이즈음의 방송 프로를 보면 한 마디로 수준 미달이랄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중파니, 종편, 케이블방송 등으로 방송국은 수도 없이 늘어났는데 채널마다 똑같은 연예인, 혹은 똑같은 패널들이 나와 온통 먹고 놀고 수다 떨기가 극악을 부리며 경쟁한다.
수다 떨기의 질도 갈수록 저질이다.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방송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어른'이란 제목이 던져주는 포괄적 사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한 미팅에서의 일이다. 나이 차가 다소 있는 선후배 전직 직장 동료들이 구성원이다. 미팅에선 언제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 건강 얘기들이 흔한 화제로 오른다. 그런데 그날은 어쩌다가 내가 꺼낸 '어쩌다 어른'이 잠시 화제의 한 축이 되었다.
갑론을박하던 화제는 '어쩌다 어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었다. 결국, 어른이 된 것이 그다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얘기는 취합되었다 할까, 그다지 명료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고 얘기는 지지부진 끝났다. 어쩌다 이리 나이를 먹었는지… 하는 자탄만 쏟아놓은 채.
대체 어른이란 무엇인가.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다 성장한 사람 혹은 나이, 지위, 항렬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항용 알고 있는 어른의 정의는 그런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성장하고 나일 먹고 적당한 지위(Position)가 있기 마련이고 또 집안(가족)의 항렬도 어김없이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어쩌다'인가. 그것은 필연 아닌가.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는 듯싶다. 그 '어쩌다'는 부정적 의미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필연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결코 어른이 되었음을 환영할 수 없는, 그리해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혹은 비양 대는, 그런 시니컬한 뜻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무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어른이다. 그 두려운 어른, 그것의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까 두렵기까지 한, 또 어른의 정의가 어떻든지 간에 그 누구도 어른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때문인가. 흔히 우리는 어린 날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의 유년 시절을 잊지 못한다. 그것이 비록 힘겹고 고달팠던 과거라 할지라도 유년 시절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왜일까.
그때는 우리가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무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혹은 잘못을 조금 했더라도 쉽게 용서가 되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되는, 철부지 시절. 티 없이 순수하고 해맑았던, 보석처럼 빛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은 어른이 된 후에도 수없이 혼자서 꺼내 보는 숨겨진 비밀이 아닌가.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영국의 계관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대표시 '무지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무지개'를 보면 제 2연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로 압축된 그의 마음이 그의 염원인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 우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오랜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워즈워드도 'And I could wish my days...'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다. 언제부터 어찌어찌해서 어른이 되었는지 몰라도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고 이웃과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하는 어른이다.
싫거나 좋거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때부터는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른-.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른인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또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일까 싶기도 하다.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란 애매모호한 말이 대두한 것은 아닌지.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사람값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는 어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른 값도 있지 않겠는가.
어른이기가 버거운 까닭은 그 어른값을 다하고 있지 못한 까닭은 아닐까. 그 때문에 '어쩌다 어른'임을 겁내는 것은 아닌지.
'어른'이란 말은 어원을 찾으면 꽤 오래고 매우 복잡한 줄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상식으로 통하는 통칭 어른만으로도 그것이 던지는 묵직한 의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른 값을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쩌다 어른'이든 필연이든 어른은 항상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가 누구이던 간에 사는 동안 어른 값 제대로 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우리에게는 숙명으로 주어져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명제인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