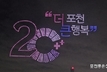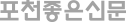동네 할아버지들이 책방에 오는 게 나는 참 좋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그분들이 서점을 갔던 적은 먼 옛날일 것이다.
카페야 어쩌다 도시 사는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갈 수는 있지만,
서점이라는 곳을, 더욱이 이런 작은 책방을
모시고 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가로운 시골책방의 어느 봄날. 할아버지 세 분이 들어왔다. 막걸리를 한 잔씩 걸쳐 모두 얼굴이 불콰했다. 이곳에서 자라고 평생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른들이었다. 한 분은 언젠가 한 번 동창회를 마치고 책방에 들러 차 한 잔씩을 하고 돌아갔고, 한 분은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었다.
처음에는 한 분만 들어왔다. 다른 두 분과 달리 얼굴이 낯설었다. 시골책방에 불콰한 얼굴로 들어온 할아버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겼다. 코로나 19로 방명록 작성이 필수라 먼저 작성을 부탁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난 글씨 몰라. 좀 이따 글씨 잘 쓰는 사람 올 테니 그 사람보고 쓰라고 하면 돼.”
그제야 나는 일행이 있다는 걸 알았다. 잠시 후 글씨를 잘 쓴다는 할아버지와 다른 한 분이 같이 들어왔다. 낯이 익은 분들이었다. 비로소 경계심이 확 풀렸다.
“아무거나 그냥 주셔. 맛있는 걸루다.”
할아버지들은 뭘 마실지 메뉴도 잘 정하지 못했다. 나는 일단 시원한 걸 드시겠냐, 뜨거운 걸 드시겠냐 물어보고 커피냐, 다른 음료냐 물어봤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들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할아버지들은 커피는 다 똑같다, 그래도 커피는 뜨거운 걸 마셔야 한다, 설탕은 알아서 타 먹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책방에 손님이라곤 할아버지 세 분이 전부. 할아버지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한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유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어울려! 아, 이렇게 공기 좋고. 더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말이야. 도시 사람들은 이런 데 오면 좋다고들 하지.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사니 좋은 줄 몰라. 그리고 이렇게 책이 있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린 안 어울려. 너, 송충이는 뭘 먹고 사는지 말해봐. 저 소나무에 사는 송충이 말이야. 우린 평생 땅 파먹고 살았잖아. 그러니 이런 책이 있는 곳에 오면 좋긴 한데 말이야, 이런 게 우리하곤 안 어울린단 말이지.”
“송...충...이? 소나무 잎? 누우에? 난 당연히 밥을 먹지!”
목소리 큰 할아버지가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목소리를 가진 글씨를 잘 모른다는 할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어 나는 혼자 배실배실 웃음이 났다.
그러다 글씨를 잘 쓴다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책들을 둘러봤다. 언젠가 딸과 함께 들렀던 그 할아버지는 당신은 글씨를 쓰는 게 좋다고 했었다. 그래서 매일 기록을 한다고 했다. 퇴비를 얼마큼 샀다, 마늘밭에 몇 포를 뿌렸다, 막걸리 한 병을 샀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다 등등 당신 생활을 기록한다고 했었다. 그때 그 할아버지 말을 듣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할아버지들 글쓰기 수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우리 손주가 책을 좋아해.”
그 할아버지는 그림책 서가에 가서 몇 권을 뒤적이시더니 한 권을 고르곤 말씀하셨다. 얼굴에는 내내 웃음이 가득했다.
“아, 이런 데가 얼마나 좋아! 공기 좋지, 책 있지, 커피 있지.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다 갑자기 글씨를 쓸 줄 모른다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그런데 여기 손님이 와요? 솔직히 말해 보셔.”
할아버지들의 말에 내내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그래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도 오셨잖아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책방에 오는 게 나는 참 좋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그분들이 서점을 갔던 적은 먼 옛날일 것이다. 카페야 어쩌다 도시 사는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갈 수는 있지만, 서점이라는 곳을, 더욱이 이런 작은 책방을 모시고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카페든 책방이든 그분들이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 당신들이 읽을 책을 사는 일도 그렇고, 막걸리 한 병 값보다 비싼 커피를 돈 내고 사드실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막걸리도 한잔 걸쳤겠다, 까짓것 한번 가자 하고 오셨을 것이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는 너무 재미있어 내내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저 할아버지 나이 때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도 만약 이 책방에 오셨다면 저 할아버지들과 똑같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시골책방이 농부의 신발을 따라 여기저기 씨앗을 옮기는 냉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 마음에 책의 씨앗이 전해져 꽃처럼 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들이 돌아간 후 내게 시 한 편이 남았다.

▲냉이꽃.
할아버지와 냉이꽃
송충이는 뭘 먹지?
송. 충. 이...? 송.. 충.. 이?
그래, 송충이!
소나무.... 잎?
그렇지, 솔잎
그럼 누에는 뭘 먹지?
누에, 누우에?
그래. 누에! 누에!
누우에는 뽕잎을 먹지.
그래!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우리지. 너랑 나랑.
그래, 너랑 나랑. 우린 뭘 먹지?
우린 밥을 먹지.
아냐, 우린 땅을 파먹지. 우린 못 배우고 땅을 파먹었지.
난 밥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 다방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도... 난 좋은데. 읽지 못해도 책이 있으니까. 좋다!
글씨를 모른다는 한 할아버지가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왔다.
얼굴 벌건 할아버지,
손주 그림책 한 권 사 들고 더 벌게진 얼굴로 말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솔직히 말해 보셔. 손님이 하루에 얼마나 와요?
할아버지들 떠난 자리에 떨어진 흙부스러기들.
냉이꽃 피어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