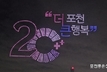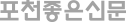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못 믿을 게 따로 있지!” “왜 말이 안 됩니까? 짐을 다 내가야 돈 드리는 게 맞지요!” “그렇게만 고집하면 안 되지요.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2년 전 딸네 집 근처로 전세를 얻어 왔었다. 계약이 만료돼 주인이 비워달라고 했다. 그래서 며칠 전 이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겪은 적이 없었던 일들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그 당혹감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음에 놀랐다. 가히 절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석 달쯤 남았던 어느 날 집주인 여자가 연락했다. 우리도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보려던 참이라 잘 됐다 싶었다. 그러나 주인 여자는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집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더러 계약 기간 만료 후 3개월만 더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자기네가 사는 집의 계약 기간이 우리의 계약 기간 만료일보다 3개월쯤 뒤라는 것이다. 참말로 자기들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차질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다. 그런 연락을 받고도 그 아주머니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 새집을 계약할 테니 관습상 전세보증금의 10%를 먼저 보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전화로 “우리가 먼저 계약하고 나서 해야지 왜 그쪽에서 먼저 계약하느냐?”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연락은 자기 남편에게만 하라고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때 알 수가 있었다. 우리 부부를 당황스럽게 했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셈이다.
화가 났지만, 그때부터 내가 나서서 전셋집 주인 남자와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몇 차례의 전화 통화가 오갔다. 계약서 쓸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해준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절벽 같기는 그의 부인과 한 치도 다를 게 없었다. 오히려 몇 수 위일 것 같았다. 부창부수(夫唱婦隨)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았다. 전세금의 일부(10%)도 보내주지 않았고 차질 없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믿음도 주지를 않았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한 안에 반환을 확약할 수는 없다”며 계속 버티었다. 도중에 내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절차로 보낸 내용증명 등기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왜 자꾸 연락하느냐?"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많은 의견교환 과정에서 그는 소위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때문에 그는 매입 순서대로 처분해야만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불안한 마음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해 나를 격분하게 만들곤 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했던 옛말이 정말 실감이 났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가운데 이사 날이 됐다. 다행히 그는 전세보증금을 그날 돌려주긴 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懷疑感)을 넘어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게 만든 최악의 사태는 이사하는 날에 일어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컷 두들겨 패주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고 해야겠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사하는 날 약속 시간에 왔다. 그러나 이번엔 이삿짐을 모두 빼내야만 보증금을 입금하겠단다. 새로 이사 갈 집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두 층 아랫집이다. 우리도 그 사람에게 잔금을 주어야 짐을 들여갈 수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서로 믿고 양보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짐을 다 내가야만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며 버티니 기가 막혔다. 이사 들어갈 집은 우리를 믿고 이미 짐을 다 내갔는데 말이다. 그 집 역시 돈을 받지 않고 열쇠를 줄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끔 한다. 특히 서로의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거래를 매듭지을 때 자주 그런 말을 듣는다. 한발씩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생각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다. 특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심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만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람을 철저히 불신하는 사실에 절망할 뿐이다.
전셋집 주인의 눈에는 돈을 안 받고도 짐을 먼저 빼내어 간 아래층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 나도 남자 주인에게 ‘그 논리라면 우리도 돈을 안 받고는 짐을 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벌써 일부 짐을 계단이나 복도로 옮기는 것 보고도 못 믿겠느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사람의 나이가 문제 될 건 없지만 아직 50살도 안 된 젊은 친구에게 환멸 이상의 악감정, 아니 극도의 분노가 치밀었다. ‘돈만 아는 불쌍한 인간’ 정도의 표현으로는 성에 안 찼다.
그날 이사는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나서서 중재한 끝에 전세금의 10%를 남겼다가 짐을 다 뺀 후 주기로 하고 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10%를 보내 준 후 돌아가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의 분노와 저주를 보내는 것’뿐이었다. 별 뜻은 없지만, 예의상 흔히 주고받는 헛 인사조차 안 했다. ‘그런 인간에게 욕하고 갈구어서 뭣 하겠느냐? 내 속만 상할 뿐.’이라는 집사람의 충고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의 내 심정은 오직 그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