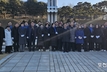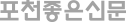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 얻을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가혹하며 그 정도도 너무 지나치다.
사람들은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함을 넘어 미화적 잣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개그적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전통적으로 품격 있는 엄한 집안의 가르침, 훈육의 시작은 바른 마음가짐, 몸가짐이다. 항상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것을 가르쳤다. 큰 뜻을 펼치려면 먼저 자신과 가정을 수양하고 반듯하게 행동하라고 타일렀다. 바로 선비 정신을 가르쳤다. 그런데 20~21세기를 지내는 사이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선비 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심하게 표현하자면 ’거꾸로 선비 정신(?)‘이 정치판 등에서 횡행(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함)함을 넘어 일반화하고 있다.
기독교 복음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늘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드물다. 그리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다른 이의 오른뺨을 치고, 강압적으로 왼뺨마저 돌려대게 하여 또 내려치는‘ 파렴치한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관인엄기 : 寬人嚴己)하면 원망을 얻을 일이 없다고 고사에서 말한다. 이러한 고귀한 전통적 가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훈육, 교육에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유교적 가르침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남의 불행에 연민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의 길 –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정치 사회 지도자가 도덕적인 문제 등 개인적 문제로 사회의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가정의 구성원이 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했을 때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사람‘ 이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선비의 길로서 중요한 우리의 전통적 가치요 정신이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즘으로 치면 사람으로 태어나 가정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주요한 덕목이었다.
사서삼경에 나오는 말이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은 후에 알게 된다. 알게 된 후에 뜻이 성실해진다.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인다.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된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일개 국민까지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를 세우거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더욱 자신부터 갈고 닦아야 함을 강조한다. 더욱 큰일을 하려면 개인적인 일을 잘 하고 인륜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더욱 엄정한 유교의 정신에서는, 불행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인 시비지심(是非之心),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말한다.
허물에 대한 복음의 말씀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기독교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다. 들보는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며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큰 들보가 대들보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가차 없이 비판하고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상대의 작은 허물과 도덕적 결함은 물론,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예를 들면 사돈의 팔촌)이나 학창 시절 행위, 친구 관계 등을 샅샅이 뒤져 작은 시빗거리라도 있으면 문제 삼는다. 삼엄한 약육강식의 정치 현장 등이라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복음 말씀도 유념해야 한다. 남의 장점보다 단점이 잘 보이고, 못하고 부족한 것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법이다. 이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면을 잘 본다는 의미일 수 있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일이 잘되면 내가 잘해서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 이웃 탓이다. 한술 더 떠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러한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네 탓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이 경향이 가정, 사회, 정치에서부터 어른, 아이 막론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이 자동차에 ‘내 탓이오’ 스티커를 붙이며 “지금은 자기를 먼저 돌아볼 때”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천주교 기도문에서는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입니다" 하며 항상 자신의 성찰을 주문한다. ‘제 탓이오’는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바치는 고백의 기도에 있다. 가슴을 치며 먼저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행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돌이켜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라'라는 맹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어떤 일에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나가라는 것이다. ‘네 탓이오’가 아니라 ‘제 탓이오’를 먼저 생각하고 자성하라는 가르침이다.
노블리주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뜻을 가진다.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귀족이니 금수저니 하는 계급적 신분이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므로 정치 사회적으로 리더의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들의 위치나 역할,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생각이다.
국가 사회적 위기 시에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하는 자세, 공익적 행위에 솔선수범하는 자세, 흠결 없는 도덕적 행위 등을 강조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병역의 의무 등에 보다 충실하고, 공인으로서 국가 재난 시의 헌신하는 자세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 대장선에서 앞장서 지휘하다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 신라의 삼국통일 시 귀족의 아들이었던 화랑들의 희생, 독립운동가였던 이회영 선생, 유일한 박사 등이 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반면에 국가 위기 시 자식을 외국으로 피란시키거나 온갖 꼼수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시키려고 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 백성은 사지에 남겨놓고 먼저 줄행랑치는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과 다름없는 제왕이나 국가 사회적 지도자도 많았다.
작은 허물에는 괴로워하는데, 큰 허물 범죄는 잊는 위선
법정 스님의 말씀이다. “때로는 큰 허물(잘못 저지른 실수)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리어 참괴(매우 부끄러워함)의 눈이 멀어 버리고, 작을 때에만 기억에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작은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다. 큰 허물은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스님조차 위선인 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다시피 하는 큰 허물과 나아가 큰 잘못, 큰 범죄가 우리 사회, 국가에는 얼마나 많은가? 용서받지 못할 그 폭력과 횡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국권 침탈에 협조를 한 자들의 큰 범죄,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의 더 큰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임에도 단죄와 징벌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판적 평가와 그에서 시작되는 자성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므로 결과적으로 매우 큰 이익이 된다.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국가 모두에 있어 이러한 과정은 발전의 초석이 되고 성숙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모두를 풍요롭고 의미 있고 깊이 변화시킨다.

서재원 교수
· 창수초등학교, 포천중, 포천일고, 서울대 졸업
· 한국방송 KBS 편성국장, 편성센터장(편성책임자)
· 차의과학대학교 교양교육원장, 부총장
·포천중.일고 총동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