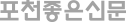꽃잎에 든 향기를 따라
눈만 뜨면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무의식과의 실랑이는 엄마의 부재를 실감케 한다. 어느 날, 어머니는 육 남매의 김장을 해줄 밭 한가운데서 속 가득 찬 배추포기 위로 짚단 넘어지듯 쓰러지셨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신 줄을 붙들고 집까지 기고 걷고 오셔서 응급실로 달려갔다. “뇌졸중입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는 서러운 이름이었다. 붉은 낙엽이 지는 날부터 눈이 내린 저녁에도 벚꽃이 흩날리어 바람에 눈처럼 내리는 햇살 좋은 봄날까지 어머니는 하얀 병실에서 세 살짜리 걸음마 연습을 했다.
뼈대 있는 집안에 신랑감이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매파 말에 시집이라고 와보니 큰집 아래채 두 칸 방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혼집이었다. 목수 기술이 있는 시아버지는 일본에 끌려가 병만 얻어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일자무식이었다. 신랑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이념이 다른 육촌형님을 숨겨줬다고 전기고문을 당한 후유증에 병약했다. 문중 논 두어 마지기 지어 5대 시제 상 차린 값으로 쌀 구경할 수 있었고, 품앗이에 길쌈에 밤잠 줄여가며 고단한 시집살이 줄줄이 딸만 셋 낳아 금줄까지 걷어 재낀 남편이다. 넷째 땐 삼복더위 산고에도 혼자 낳아 돌 지난 딸아이 달래 머리맡에 가위 달라고 하니, 들었다 놨다 엄마랑 놀잔다. 손수 탯줄 자르고 솟는 오줌발에 씨앗 설움 달래고 아이 울음소리에 시어머니 남편 달려와서 장 닭 잡는다. 고추밭이 소란스러웠다.
허리에 금이 가 수술한 날도 허리 복대 졸라매고 머리에 이고 들고 서울역에 내려 전화하신 그 분 몸무게 40킬로보다 더 커 보인 보따리를 풀어보면, 참깨, 콩, 조, 고추장, 참기름 등등 화수분처럼 나온 사랑의 징표들이 수두룩했다. 추석 때 찧은 올벼 쌀까지 자식 입에 넣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에 뼈 시린 아픔도 그 마음을 당해 내지 못했다. 우리 집은 농토가 유일한 생업의 터전이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밭으로 들로 나가 밭을 매고 자식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밭을 구르고 넘어지고를 반복했다. 저녁이면 고단한 몸에도 일찍 눕는 일이 없으셨다. 천근 같은 눈 올리면서 오일장에 나갈 삼베 실 삼느라 첫닭 우는 소리에야 몸을 누우셨다.
팔순 넘어가는 세월 고개는 어찌하지 못하나 보다. 중환자실을 오가면서도 정신만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얼굴 비치는 게 전부인 자식들에게 ‘오지 마라 힘들어 어쩌냐! 내 새끼들 고생시켜 미안하다’ 하시며 당신의 처지 걱정보다도 자식 힘들어한다며 자책으로 사셨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전화하시는 게 낙이 되어버린 무료한 시간 기댈 것은 자식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기에 아련한 눈빛에서 살아온 긴 날보다 짧은 살날이 더 길 것 같은 시간의 불안한 허무감을 어찌 모르겠는가. 삭정이가 된 혈관에 생명의 탯줄로 사그라져 가는 생을 잇고 삼키는 힘까지 놓아 배 속 탯줄 연명하듯 코로 줄 넣어 흘러 내려간 시간에도 눈 속 가득 자식만 넣는다. 그것은 어머니란 이름으로 가능한 체념이며 가난의 굴레 속에서 감내하고 껴안아야 할 어머니만의 고독한 세계였다. 하지만 성스럽고 초연한 자아였음을 지금 밝히면 무엇하리.
한겨울 문틈을 비집고 든 엄동의 칼바람은 아궁이 속 불빛을 세차게 후려치며 갈라놓기도 했다. 그때 일렁이는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언 손등이 마치 단풍이 든 듯 울긋불긋해 보였다. 그 모습은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 시절 농촌의 빈곤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두터운 벽이 되어 밭을 찾아 들길을 오르내리는 어머니셨다. ‘아버지! 날 좋은 날 엄마 데려가세요. 만나시거든 아프지 않은 몸으로 엄마 업고 다니면서 꽃놀이 단풍놀이 많이 다니시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살이 시키면 아버지는 엄마 편 들어주셔야 해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조선 팔도 너 같은 며느리 없다’ 반평생 치매였다 돌아가신 날 정신 돌아와 하신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눈 감으신 할머니. ‘용돈 모아 천만 원 통장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 가신 아버지,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옆자리가 내 자리다. 수의 한 벌 더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모은 돈 병원비로 다 내놓으시고 장례식장까지 동네 어르신들 가까운 곳에 하라고 정해주시고 가신 어머니, 삼일장 내내 비 오고 바람 불더니 긴 여행 떠나가는 그 아침은 어찌 그리도 화창하던지 사는 어제고 생은 오늘이 아닌가! 꽃잎에 향기 맡으러 의식보다 내 발걸음이 먼저 나선다. 돌아갈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무의식의 저항 속에 잠겨 하늘이 무너지는 통곡에도 나는 나비의 가벼운 몸짓에 눈길 보며 따라간다.

박선영
시인
아호: 초연(草然)
포천문인협회 정회원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현)실버인지재활책놀이 교육사
2018년 대한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
2018년 대한문학세계문예지 시 등단
2022년 포천사랑백일장대회 운문부분 장려상
2023년 반월제 백일장 대회 시 부분 우수상
2022~2023년 포천예총 시화전 출품
2019~2023년 포천문예대학전집 시, 수필 수록
2022~2023년 포천문학전집 시 수록
2023년 포천좋은신문 시 게재
2023년 포천소식지 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