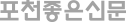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필자 김은성.
Day-41, Icefields와의 해후 그리고 작별
이곳에서 허락된 마지막 날, Canadian Rocky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재조명해본다. 어젯밤의 폭우로 말끔하게 세수하고 그 찬란한 미모를 구름 사이에서 훤하게 드러낸 캐나다 로키를 보며, 빙하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방대하고 넓게 퍼져서 icefield(얼음 벌판)라고 부르는 고대의 얼음덩이들이 즐비한 길, 캐나다의 자랑거리, Icefields parkway를 달린다.
가는 길에, 이곳에 수다한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 Bow lake에 잠시 서서 귀여운 기념품을 발견하고 구입하려는 순간, 신용카드가 없어진 걸 알게 된다. 숙소로 돌아가 확인하고 없으면 분실 신고하자고 하니, 남편은 '오늘 놀 거 다 놀고 돌아가서 확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잊으라고 한다. 조바심이 났지만, 그 말도 맞는 듯 해서 잊으려고 엄청 노력하기도 전에, 말도 안 되게 잘생긴 로키산맥의 미모에 정신이 빼앗겨 금방 잊는다.
빙하에 매료된 남편이 제일 행복해 하며 8시간 운전을 즐겁게 해낸 건 좋은데 너무 신나게 달려서 재스퍼 가는 길목에서, 캐나다 경찰에게 속도위반 딱지도 선물받는다. 벌금 액수가 기둥뿌리 뽑힌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도 지금 누리는 icefield 와의 해후의 기쁨을 희석해선 안 되는 거다. 오늘이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날인데...

4시간 걸리는 재스퍼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4시간 눈 앞에 펼쳐지는 경치에 경탄하며 차를 달려서 집으로 돌아온 하루지만 8시간 동안 펼쳐지는 캐나다 로키의 파노라마, 그 옆을 흐르는 물색, 우리가 모르는 시간의 실체인 신비로운 얼음의 대평원이 엄청난 호사를 선사한다. 100불 가깝게 바친 5일분 입장료가 20분 전에 유통기한 만료되었다며 하루 치 19불을 더 내라는 캐나다 인심이 각박하기도 한데, 앨버타주를 로키가 먹여 살리는 듯 하니 아쉬운 사람이 지갑 열어야지 별수 있으랴. 미국에서 62세 이상 어르신이라며 거의 공짜로 드나들다가 이 동네는 야박하다고 아주 잠시 1초간 섭섭하다.

날씨가 궂어서 방콕으로 휴식했지, 여기 머무는 동안 계속 맑음이었으면 몸이 너덜거리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헤메고 다닐 뻔했다.
집으로 돌아와, 신용카드 분실신고하고 문제 해결... 이 정도의 굴곡은 감사한 거고, 속도위반 벌금도 여행비로 넣고, 캐나다에 바치면 된다. 캐나다에서 그동안 돈을 너무 쪼금 썼었나 보다.
내일은 휘황찬란한 자연의 갤러리 같은 이곳을 떠나 캐나다 시골을 달릴 거다. 자동차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지나칠 일이 없는 동네를 지나가 보고 들러 보는 거다. 번쩍이는 화려한 미모의 밴프도 좋지만, 집으로 가는 길... 캐나다의 시골과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자동차로 달려보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즐거움이 되어줄 거다.

Day-42, Canada에서의 마지막 밤
수요일마다 이사다니는 nomad(유목민) 생활 6주 차, 집 떠난 지 꼭 6주 만에 캐나다에서 마지막 숙박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들어선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위풍당당 솟아 있는 로키를 뒤에 두고 떠나, 캘거리 거쳐서 캐나다의 1번 국도를 따라서 동으로 달리는데, 금새 저 뒤에 로키가 진짜 있었나 싶은 평지가 8시간 동안 계속된다.

지평선 끝에서 가끔 마을을 만나고, 4시간 운전해서 만난 도시, Medicine hat에서 Walmart를 찾아서 7천 마일 가까이 달려준 자동차의 oil change도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월마트 안에서 점심도 먹는다. 캐나다의 Dunkin donut 같은 Tim Horton이라는 가게엔 맛있는 pastry, donut 그리고 구운 샌드위치, 파니니를 맛있게 만들어 판다. 자체 브랜드 커피도 맛있어서, 유럽풍의 던킨도너츠라고 느껴진다. 파니니 셋트 메뉴에 디저트로 도넛이 끼워 나온다. 미국에선 못 보는 컴비네이션.
앞으로 2천 마일 더 달려줄 우리 차에 엔진오일을 갈고 나니 마음이 뿌듯하다. 늘 보던 Walmart지만, Restroom 대신 Washroom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스럽다.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는 점과 도자기 굽기 좋은 진흙이 많은 곳이라서 도자기 공장이 많다며 둘러보라는 visitor center의 정보에 매우 솔깃했으나, 갈 길이 멀어서 아쉽게 패스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분청 자기는 장작가마에서 구워야 불이 튀긴 자국이 있어서 더 운치가 있는 거로 쳐준다는 말이 생각난다. 장작 말고 천연가스 가마에 구운, 맘에 드는 도자기가 있은들 어차피 안 사기로 한 것을... 시간이 있어서 들렀었으면 아마 뭔가 사들고 나오고 말았을 것 같은 예감의, 이쁜 파스텔톤의 도자기들을 Visitor center에서 봐서 아쉽기 짝이 없긴 하다.
인디언들이 쓰던 지명인듯한 Medicine hat은 도시의 상징물도 철물로 지은 인디언들의 티피로 세웠다. 여기서 1시간쯤 달리니 앨버타주가 끝나고 누가 봐도 인디언 언어인 주 이름, Saskatchewan으로 들어선다. 인구 백만 정도 사는 평평한 땅엔 소금기 가득한 호수들이 있어서 badland라고 불리는 지역도 있다. 목축업이나 해야 할 넓고 넓은 평원을 달린다.
Mennonite heritage village가 있다기에 들러보고 싶지만 김 기사님이 오늘은 갈 길이 멀다며 그냥 달린다. Canadian Mennonite 는 나에게 젊은 날의 추억을 불러낸다. 16세기 유럽에서 main stream과 달리, 유아세례를 부인하고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여 (요즘 기준으론 구구절절 맞는구먼) 박해받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온 메노나이트는 주로 농장에서 소박한 simple life를 추구하는 기독교 종파이다. Saskatchewan 주에 2만 명 정도의 메노나이트가 있다니 인구의 2프로다. Walmart에서 Amish와 비슷한 복장의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그들이 누굴까 궁금하던 의문이 풀린다. Amish는 Mennonite 사촌쯤인데, 지금도 자급자족하며 옛 방식으로 다른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산다는 점이 다르다.
메노나이트는 대도시에 나와 살아도 집에 TV가 없고 창문에 커튼도 달지 않는다. 우리 애들 어릴 때 가끔 베이비싯 해주던 이쁜 소녀가 살던 옆집이 메노나이트였는데 TV도 없고 커튼도 없는 집에서 사는 점잖고 친절하고 온화한 이웃이었다.
30살쯤에 친구로 사귄 캐나다에서 온 메노나이트,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가깝고 애들 나이도 비슷하고 신앙도 같아서 미국에 와서 사귄,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귀한 친구라고 여겨진 직장동료였던 지니가 생각난다. 미국 직장 동료 중, 직장을 떠나 사생활도 같이 나눈 건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녀와 내가 아이들까지 함께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나와 가깝다고 여기고 있던 흑인 동료가 매우 심기 불편해 해서 몹시 당혹했던 기억도 있다.
내가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이라 여기며 친하게 생각했는데, 백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는다고 생각되자 나에게 안면을 싹 바꾸던 흑인 친구를 20년쯤 후에 나의 부하직원으로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다. 내가 사랑한 친구 지니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대로 남미에 선교사로 떠났고, 이메일이 없던 그 시절 우리는 손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애들 키우며 힘들던 그 시절, 무슨 정성으로 영어로 쓰는 편지를 빼곡하게 써서 보낼 수 있었는지, 그때만 해도 순수하고 어렸던 거 같다. 하긴 지금 우리 애들이 그 당시 내 나이다.
그녀가 남미의 밀림으로 가서, 마호가니로 지은 통나무집이 자신들의 숙소라고 쓴 편지를 읽고, 마호가니 통나무집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던 걸 남편도 기억하고 있다. 집에 가면 그녀의 편지를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싶다.
무료한 지평선을 향해가는 여정에서 아득했던 젊은 날의 친구를 다시 추억하며 500마일 달려서, 캐나다의 마지막 밤을 보낼 도시, 이름도 시골스러운, Moose jaw로 들어온다.

저녁 7시 30분. 아직 해가 있어서 캐나다의 시골 마을 다운타운을 돌아보고 Saigon 75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그럴듯한 국적 불명의 음식으로 저녁을 때운다. 75라는 숫자는 월남전이 끝난 해를 의미한다며 월남에서 2002년에 왔다는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런 구석진 곳에도 중국음식점은 몇 개나 보인다. 문득 샤모니에 가서 한국 식당 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스친다.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고생길이다!

내일은 캐나다 조금 더 달려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미국으로 전화하면 국제전화 아니고 장거리 전화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어, 미국과 캐나다는 한 통속인 거 맞긴 한 듯도 하고, 굳이 화장실을 washroom이라고 부르는 딴 나라 딴 문화가 미국의 꼭대기, 북위 49도 위에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
내일 아침 호텔에 팁으로 놓고 갈 캐나다 돈이 남아 있어 다행이다.

Day-43,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다
이제 국경을 넘어와, 관광객이 제일 안 찾는다는 주, 그러나 실업률도 제일 낮고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인구 70여만의 north Dakota 의 행정수도 Bismarck에서 숙박하며 6주간의 여행기를 접는다.
보살피고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할 일상을 덮어두고 문 닫아 걸고 달려 나와 미지의 땅들을 밟아보고, 아름다운 자연들과 만나며 아프지 않고 무사히 보낸 지난 6주간은 우리 인생에서 선물이었다. 매일 선물만 받으면 선물은 더는 선물이 아니듯, 이제 다시 껴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일상으로 돌아간다.
내일은 미네소타에 사는 대학 동창의 집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일상이 기다리는 남동쪽을 향하여 가게 될 거다.
Epilogue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떠날 때 예정한 바로 그 날짜, 목요일에 떠나서 목요일에 49박 50일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9,000마일 운전해서 캐나다 땅까지 밟고, 전혀 다른 scenery의 우리 동네로 오니 지난 7주간의 일들이 실제상황이 아니었던 듯 느껴진다. 내 눈앞에 펼쳐진 시야와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끊긴 그림이다.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antique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 한 움큼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떄문일 수도 있다. 6주간의 여행기를 쓸 수 있어서,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듯 문득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 기록으로 흔적이 남게 되어 다행이다.
남편과 만난 대학 4학년 여름방학의 여행길에 함께 했던 특별한 인연의 대학동창이 사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친구의 따스한 환대 가운데 4박 5일 머물렀다. 지나간 시간의 잔해를 예술로 보존해가며 혹독하게 춥고 긴 겨울의 잔상이 느껴지는 예술과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도시에서 지나간 시간을 공유한 옛친구와 보낸 시간이 마치 그 도시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각자 살아온 시간을 다시 열어보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너져가는 옛 건축물들을 없애버리는 대신 아름다움으로 남겨둔 유적들같은 우리들의 젊은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을 이야기하기엔 딱 어울리는 도시다.
미네소타에서 떠나 인디애나 Purdue university가 있는 Lafayette에서 일박하고 집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scenic drive(경치 좋은 도로)로 달리던 Pennsylvania 산길에서 아름다운 리조트를 발견하고 여행의 피날레로 마지막 밤을 유숙하고 환한 대낮에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리는 순간, 폐가로 변해있는 나의 정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천천히 정리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는 잡초들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해서 우선 마구 뽑아준다.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끊임없이 잡초를 뽑으며 돌보고 정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구나... 이생의 장막을 거둘 때까지, 깨어서 주변을 정리하며 삶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되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새삼 뼈져리게 실감한다. 무너져내린 일상을 다시 일구어 세우고,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하다.
길고 긴, 7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를 기다리는 일 더미로 무사히 돌아와 감사하다. 그동안 함께 해준 독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감성과 경험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것을 다시 느낀다.

▲우리와 함께 여행을 마친 꽃바구니는 미네소타에 사는 친구에게 주고 왔다.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필자 김은성의 '미국 대륙횡단 여행기'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김 작가는 추후 '유럽 미술여행기'를 구상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