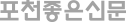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필자 김은성 작가.
Day-37, Yoho 국립공원 대충 보기
Banff라고 하면 이 근처 5개 국립공원을 합쳐서 통용되는 유명관광지라고 보면 된다. 제일 유명한 Banff와 Jasper는 3년 전에 하루에 10마일 정도 발품 팔며 꼭 봐야 하는 곳을 거의 섭렵했고, Waterton은 몬태나에서 국경 넘나들며 진도 떼었으니, Waterton에서 하이킹할 때 만난 캐나다 노부부들이 추천한 나머지 두 공원, British Columbia 주에 속하지만, 앨버타주에 위치한 Banff와 붙어있는 Yoho와 Kootenay 국립공원을 보고 갈 생각이다.
아침에, 느긋하게 준비하고, resort에서 숙식하는 휴양객답게 11시에나 슬슬 행동 개시다. 일기예보대로 비가 줄줄 내리는데, 처음 이곳에 왔다면 낭패다... 싶을 깜깜하게 흐린 하늘과 비 오는 밴프가, 두 번째 오니 이런 날씨의 경치도 보게 되는 기쁨이 된다.
인접해 있는 British Columbia 주로 넘어가 Yoho로 가는 길도 화려한 로키의 파노라마가 계속되고, 인구 167명이라는 작은 마을 Field로 들어서니, 샤모니 계곡에 있던 시골 마을같이 이쁘게 꾸며놓고 장작도 줄 맞추어 쌓아놓았다. 모든 집이 거의 다 guest house라고 쓰여 있고, no vacancy sign이 걸렸다.

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산장 겸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는데 실내장식은 물론, 고급 고기의 상징인 wagyu beef 넣어서 만든 flat bread, kale salad등 우리가 마치 프랑스의 알프스 산중에 와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에선 최고급 동네에서나 보는 분위기가 프랑스엔 알프스 산골 깊숙이에도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캐나다도 그렇다.
음식의 분량도 유럽처럼 소량이라, 미국에서 하듯이 주문해서 다 먹고 나니 배고프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배고프다고 더 시키기는 눈치가 좀 보이고, 더 시켜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할 테니까 아쉬운 채 카페를 나온다. 맛있는 음식 조금 얻어먹느라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으니....
마을 앞엔 유명한 Canadian Pacific Railroad가 지나가고 어딜 봐도 다 깎아지르며 솟아오른 로키가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밴프와 루이지 호수가 너무 바글거리니까, 이런 곳 guest house에서 묵는 게 더 분위기 깊을 것 같다.

마을에 있는 한 pottery에 들렀더니 고려청자 같은 느낌의 도자기를 만들어 판다. 고려청자 같다고 했더니 주인아저씨는 일본사람들이 우리 도공들을 잡아다가 도자기 만들게 한 역사까지 줄줄이 꿰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자기가 좀 nerd(공부만 아는 모범생)라며, 겸손한 척 하면서도 잘난 것을 드러낸다. 도자기가 특이하고 아름다워 사고 싶었지만, 살림살이 안 늘리려고 그릇 사는 걸 쭉 참아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공방 앞에 까만 피튜니아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예쁘다고 했더니 밴프에 있는 화원에서 샀다고 한다.

Visitor center에서 뽑아준 Yoho의 top 3은 다 발품 안 팔아도 보는 곳이다.
그중 1위, 에메랄드 호수.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루이지에 절대 밀리지 않는 물색이다. 빨간 보트에 신부와 화동을 태우고 신부 아버지가 결혼식 장소인 건너편의 lodge로 노 저어 가는 그림 같은 장면을 보며, 인생이 늘 저렇게 그림 같으면 오죽 좋으랴...
어차피 인생은 파도치는 험난한 여정이니까 더욱더 우리 인생에 저런 아름다운 그림을 끼워 넣으며 살아가는 것이 영양가 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스친다. 호숫가에 그림 같은 산장을 보니, Chateau Fairmont에 묵어보고 싶은 생각은 싹 달아난다. 조용하고, 충분히 아름다운 에메랄드 호수가 여기 있는데 북새통에서 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사랑이 움직여도 되는 건가 싶게, 페인트 통 엎질러진 물색과 그림같이 아름다운 lodge에 푹 빠져든다.

2위는, 빙하에서 무섭게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를 깎고 뚫은 Natural bridge. 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조각품도 자동차에서 내려 바로 볼 수 있다.

3위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 낙차를 자랑하는 Takakkaw 폭포다. 이 폭포는 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빙하에서 녹아떨어지는 물줄기인데, 심하게 꼬불꼬불한 길을 자동차로 올라가면, 역시 발품 안 팔아도 보여주는 장관이다.

숙소를 나설 때 새까만 하늘에서 비가 오더니, 우리가 사진 찍고 경치 감상할 때는 해도 나고 비도 잠잠해지는 친절한 날씨 덕에 오후에 Yoho 대충 보기(crash course)를 마칠 수 있었다.
4번으로 꼽힌,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spiral tunnel은 기차가 아직도 드나드는 280도 터널인데 멀리 있어서 사진으로 소개하긴 어렵다. 100여 년 전에 이 험준한 산속에 구멍 뚫어가며 산업을 발달시켜간 캐나다의 역사를, 후손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다.
이 지역을 탐사하던 시절, 말들도 험산 준령에 너무 힘들어서 탐사팀 소속 의사를 발로 뻥 차버린 일이 있어서 지역 이름이 Kicking horse가 되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의 캐나다를 이룩했는지 말해준다.
9시에도 환한 북쪽 나라, 돌아오는 길엔 우리 동네 Canmore의 이쁜 다운타운도 둘러보고, 상점도 기웃거려도 여전히 해가 있다. 4주간 노숙한 우리에게 대궐 같은 숙소가 기다리니 귀가하는 마음이 가볍다. 캠핑이 주는 짜릿함의 유통기간 만료되고,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휴식할 시간이 된 거 같다.

Day-38, 비 오는 광복절
오늘은 대한독립만세 70주년이 되는 날.
몬태나에서 노숙하는 2주 동안엔 땅이 젖을 정도의 비다운 비는 통 못 봤는데, 어제 밤새 천둥 번개 동반한 비가 내리고 아침엔 해가 떠도 뜬 게 아닌 구름 가득한 날씨로 하루가 열린다. 어른이 되자마자 타국에 와서 우물쭈물 살다 보니 광복 70주년이라니까, 그 세월이 문득 무게감으로 가슴을 내리누른다.
비가 살짝 멈추는 듯해서 어제처럼 알프스에서 점심 먹을 꿈을 갖고 집을 나서서 Kootenay로 향한다. 밴프를 벗어나 Kootenay로 접어들자 하늘이 다시 깜깜해지고, 가시거리가 짧아진 가운데 비가 내린다. 관광으로 보고 가야 할 곳들이 있어도 내릴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어 산 너머 마을까지 햇살을 꿈꾸며 달려간다.

Kootenay park 서쪽 끝까지 가니 Radium이라고 불리는 노천온천이 있는데 풀장 스타일이라고 패스하고, information center에서 들은 대로 백조의 호수라고 불리는 동네공원에 있는 야생온천을 향해서, 김 기사님이 가보겠다고 한다. 비도 오고 비포장도로 운전해야 한다니 안가면 좋겠구먼...

공원밖에서 온천을 찾아가는 두세 시간 동안 만나는 캐나다 시골 마을들은 그 길의 끝이 대도시인 밴쿠버에 닿아있는 Yoho 쪽과 달리, 촌 동네 몬태나와 닿아 있어서인지 초라한 시골이다. 식당들도 그럴듯해 보이는 건 저녁에만 열어서 허접한 곳에서 점심을 때운다. 장마다 꼴뚜기도 없지만 매일 프랑스의 알프스 마을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 행운도 없는 거다.
집 떠난 지 두세 시간 운전해 찾아간 백조의 호수 입구에 '비포장도로 22킬로!'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서야 김 기사님이 온천을 포기하고 차를 돌린다. 왕복 44킬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2,000마일 달려 우리를 집으로 싣고 갈 자동차의 안위가 염려되니까...
다시 비 오는 길을 3시간 운전해서 벽난로도 여러 개씩이나 있는 안락하기 짝이 없는 집으로 돌아와서 광복 특집프로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을 시청하며, 7시간 동안 빗속에서 차만 타고 다닌, 요번 긴 여행 중 가장 비생산적인 하루를 접는다.
조국이 광복 후 지난 70년간 이루어낸 빛나는 발전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지나간 그 세월의 무게가 캐나다 로키의 하늘을 덮은 구름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오늘이다.
Day-39 비 오는 주일날
밴프에 한인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기에,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언제 예배드리는지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정보를 못 찾겠더라는 또 다른 사람의 글만 올라와 있다.
우리 숙소가 있는 Canmore의 현지교회로 가기로 하고, 웹사이트에 소개된 글로 미루어 가장 복음적일 것 같은 Trinity Bible church로 향한다. 이동네에 가득한 그림 같은 건물들 사이에 너무나 뭉뚝하고 소박한 건물이라 오히려 눈에 띄는 작은 교회다. 6, 70명 정도 모여 예배드리는데, 담임목사님이 휴가 중이라며 평신도가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의 조국 캐나다를 위해 기도하고, 폭발사고 난 중국과 그밖에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 말씀 선포를 시작한다. 저런 기도가, 우리나라 동란 중에도 자국의 군대를 보낸 사랑이라고 생각되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내 가족의 안위에나 머무는 얄팍한 나의 사랑의 두께가 너무 부끄럽다.

누가복음의 '잔치 초대 비유'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이려고 식탁에 초대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집을 열고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것을 주제로 선포된 말씀 중,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은 거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대목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 새겨진다. 때로, 꼭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의 알량한 수고를 몰라준다고 느끼며 고단했던 적이 떠오른다.
예배 후 오락가락하는 비를 내다보며 안락한 집에서 점심을 먹고, 지난번 Banff 여행에서 미처 못 본 곳이라며 Minnewanka 호수와 Banff village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스키장 Norquay mountain을 향해서 외출한다.
춥고 비 오는 사이사이 숨바꼭질하는듯한 햇살 아래, 드넓은 호수 하나 더 눈도장 찍고, Ski lift chair에 실려 산으로 올라간다. 꼭대기 카페에서 라떼와 와인을 시키고 quinoa salad와 peach cobbler도 간식 삼아 먹는다. 잠시 구름이 걷히고 빼꼼히 보여주던 Banff village가 먹구름에 완전히 가리고 비까지 억수로 내리는 동안엔 정상의 cafe에 갇혀있는 느낌이 든다.

잠시 먹구름이 걷히자 와인 한잔 걸치고 마냥 거기 있어도 좋을듯한 표정의 남편을 재촉해서 리프트 타고 내려오는데, 스키 타러 올라가며 타봤어도 완전히 열린 공간을 내려오는 건 처음인데, 까마득한 아래가 다 보이니 너무 무서워서 현기증이 난다. 내일부터 개인다는 일기예보가 정확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춥고 어두운 주말을 마감한다.
Day-40, 비싼 방콕
오늘은 재스퍼 쪽으로 가서 캐나다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길, Icefields parkway로 갈 예정이었다. 자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문득 너무 피곤하다고 느껴진다. 다시 잠들려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지 8시 반에나 침대에서 나온다.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으나 구름이 모든 산을 두텁게 구름으로 가렸다. 이런 날씨에 운전하고 나가봐야 눈에 뵐 것이 없으니 아침 일찍 뛰쳐나가기로 한 예정을 접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Canmore downtown을 어슬렁거려 본다.

애초에 이곳에 숙소를 잡을 때, 아름다운 산 가운데 자리한 이 동네에서 일주일 정도 박혀 있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오니 유명하다는 주변을 이리저리 들러보게 된다. 부동산에 매물이 나온 걸 보니, 경관이 뛰어난 위치라서 대단히 비싼 동네다. 이곳에 오니 생각나는 비슷한 동네, 프랑스의 샤모니보다 더 비싸지 않나 싶을 정도다.

여름에 두어 달을 보낸다면, 알프스 자락의 샤모니가 밴프보다는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준다. 산도 즐기고 Day trip으로 가볼 만한 유럽의 여러 도시와 가깝다는 점이, 옹기종기 좁은 유럽이 가진 장점이다. 이곳은 넓고 넓은 미대륙이라, 여기서 10시간 떨어진 밴쿠버까지 가는 길이 아름답다고 하여 가볼까도 싶은데 몸이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고 주장한다.
잠시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집으로 와서 그동안 못 본 연속극을 졸며 자며 보았다. 이 먼 데까지 와서 비싼 호텔비 주고 연속극을 보는 방콕의 호사. 연속극의 좋은 점은 마구 졸며 자며 봐도 스토리를 다 꿸 수 있다는 거다. 점심 먹고 내내 졸다가 저녁에 외출하자는 남편을 따라나서다가 주저앉는다. 오늘은 방콕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방에 콕-. [계속]
※ 본지에 인기리에 연재 중인 김은성 작가의 '미국 대륙횡단 여행기'는 다음 회로 대단위의 막을 내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