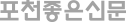Day-28, Dream catcher
Nomad(유목민)로 살던 인디언들처럼 수요일은 우리가 이동하는 날이다. Glacier park의 동쪽에 터 잡고 산불에 막혀 그쪽에서만 놀다가 예정에 맞추어 서쪽으로 이동한다. 관통하는 도로가 아직도 산불로 막혀서 공원 밖으로 돌아서 두시간 반 걸려서 간다.

공원 밖의 동쪽 벌판은 Blackfeet Indian reservation(인디언 보호구역)이고 우리가 방문했던 Browning은 그 중심지에 속한다. 몬태나주에서 발행한 관광가이드에서 추천한 Blackfeet trading post(서부시대엔 상점을 이렇게 불렀다)에 가서 인디언들이 만든 Dream catcher 귀걸이를 사서 걸었더니 마을에서 만나는 인디언들이, 자기들 물건인 줄 알아보고 이쁘다며 자화자찬이다.

인디언들만 사는 동네에 있는, 입장료 5불 받는 인디언 뮤지엄에 가니, 인디언들의 의식주 artifact(유물)가 많이 전시되어 있다. 16세기까진 미대륙에 말이 없어서 에스키모처럼 개들하고 살며 사냥도 하고 이동도 하며 살다가, Spaniards(스페인 정복자들)가 유럽에서 들여온 말들이 도망 나와 야생마가 되고 그 말들을 길들여 타고 다니게 되며 인디언들도 문화와 경제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한다.
말 타고 빨리 달리게 되자, 사냥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잃을 것이 없던 시절과 달리, 풍요로워진 내 것을 지키고 더 키우려고 이웃 부족과 전쟁도 하느라 용사도 되고 영웅도 되고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그러다가 유럽인들과 이권과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고, 패하여 오늘에 이른 거다.

우리 민족과 DNA가 밀접할 수도 있다는 인디언들의 전설처럼, 몬태나의 바람결에 날아다니는 꿈을, Dream catcher의 web(그물)이 낚아서 내 것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나도 귀걸이로 사서 걸어본다. 인디언의 나라 몬태나에 유숙하는 동안 매일 걸고 다닐 생각이다.
서쪽 캠프는 빼곡한 침엽수 숲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동쪽보다 습한 이곳은 산불에 강한 lodgepole 대신, Hemlocks(넓게 자라는 침엽수)와 cedar tree(향나무)가 주를 이룬다. 그동안 차에서 자다가, 텐트를 펼치니, 새삼 아늑하고 럭셔리하게 느껴진다. 그동안은 차에서 자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는데 변덕이 죽 끓듯 한다.

남편이 오매불망하던 Going to the sun road(태양으로 가는 길). 새살림을 차린 후, 해가 긴 저녁에 드디어 올라가 본다. 50마일 중 서쪽 30마일 열려서, continental divide(미대륙을 동서로 가르는 로키산맥의 꼭대기 지점)의 미시령 같은, Logan pass까지 간다. 1930년대에 이런 비전으로, 이런 공법으로, 직벽으로 하늘을 찌르는 산허리에 길을 내다니... 태양을 향해 오르는 바로 그런 느낌의 산길을, 아찔하게 올라가며 인간과 자연의 합작품의 비경을 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쑤시고 다니고 싶어서 새벽부터 바지런 떠는 남편에게, 이젠 군소리 안 하고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결심해 보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시험 잘 보는 거 몰라서 공부 안 하고 자는 거 아니지 않는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게을러지고 싶다고 계속 중얼댄다.

그동안 뜨겁던 날씨, 공원의 서쪽은 태평양에서 오는 훈기로 10도 이상 더 덥다고 했는데, 태양이 구름에 가리자마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비도 오는 척 마는 척 조금 뿌리고 지나간다. 몬태나의 땅은 건조하게 비를 기다리고, 산불은 아직도 타오르지만 노숙하는 캠퍼의 입장에선 마른 땅이 진 땅보단 고마운 거 맞다.
캠핑 4주째 들어오며, 이제서야 캠핑이 더 찐하게 즐거워지는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Day-29 돌들도 아름다운 꽃동산
오늘 아침엔 여기서 제일 유명하다는 12마일 하이킹 코스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새벽에 비가 후드득 오는 소리가 들려서, 휴 다행이다... 비가 오니까 하이킹 안 하고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싶고 팔다리도 쑤시는 것 같아서, 텐트에서 뭉개면서 오늘은 맘껏 늦장 부릴 거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막상 나와보니 새벽의 후드득은 땅도 못 적신 비였지만,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고 불볕더위는 어디 갔나 싶게 싸늘한 아침이다.
내가 캠프에서 행복하기 위해선 아침 끼니를 거나하게 해 먹으며 커피도 홀짝이고 심심하면 하이킹을 가보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집 밖에 나오면 갑자기 바지런해지는 남편은 꼼꼼히 준비해온 정보대로 하이킹하러 가야 행복하다. 오늘은 나한테 져주는지라, 오후에 어제 할까 말까 망설인 짧은 코스를 가자고 한다.
늦은 아침을 먹고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 등을 월말 결산하기 위해 Visitor center로 오니 인터넷이 너무 열악하다.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 근처에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 Visitor center로 가보라고 알려준다. 우리처럼 예까지 온 김에 캐나다로 가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에 들어서니 붐비지도 않고 너무 친절하고 와이파이도 양호하다. 앨버타주도 몬태나처럼 들장미가 주의 꽃이라 건물 위를 들장미로 장식하고 실내엔 앨버타주에 지천이라는 공룡 뼈로,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티라노소로스가 서 있다.

미국에서, 캐나다가 제공해준 와이파이로 사무 보고, 여행기도 쓴 후 매우, 몹시, 아주, 내 맘에 쏙 드는 나의 숲속 작은집, 캠프로 돌아가 점심도 차려 먹는다. 비가 다시 살짝 내려서, 식탁 위에 장막을 지어 올린다.
점심시간 후 오후반으로, 태양을 향해 가는 길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셔틀을 탄다. 옆에 타고 가도 아찔한 길을 운전하는 기사들 중 대다수가 아줌마들이다.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대부분의 미국 아줌마들이 문득 안쓰럽다. 부자나라에서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차 더 팍팍해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공짜로 태워주는 잘생긴 셔틀은, 아찔한 산길을 운전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친절 차원은 아니고, Going to the sun drive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아름다운 트레일 코스에 가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자동차가 오르내려 대기오염이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 Logan pass까지 1시간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줄 서고 셔틀을 기다려야 하므로 2시간 걸려 올라간다. 그래도 큰 차로 올라가니 어쩐지 더 안락하고 덜 무섭기도 하다.
어제 이어 다시 가본 Logan pass는 시베리아 같은(안 가봤지만) 강풍이 불고, 주머니에 깊이 넣어도 손이 시리고 빗물도 뿌리는 사나운 날씨다. 바람도 억센데, 그냥 visitor center에서 영화 보고 둘러보고 인증샷 박고 다시 셔틀 타고 내려가면 좋겠지만, 약속한 게 있으니 3마일 걸어 Hidden lake를 보러 간다. 6마일 걸어 호숫가까지 가겠다고 나섰으나 바람도 심하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막차 시간도 다가오니, 3마일로 마감한다. 6마일 고 내일 새벽에 어찌 10여 마일을 또 걸으라는 건지... 속으로 투덜거리며 숨겨있다는 호수를 향해 걷는다.

늘 투덜대고 오지만, Logan pass의 너른 평원은 돌들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야생화의 천국이다. 호수에서, 30살 생일 맞아 미국 50개 주를 돌고 있다는 청년이 30이라고 쓰인 풍선을 들고 울상지으며 인증샷을 찍는다. 30살이 되니 서른, 잔치는 끝났다... 라고 생각되고 있나 보다. 내 눈엔 핏댕이구먼.

짧은 트레일이지만 추워서 몸에 힘주고 걸었더니 내려오는 셔틀 안에서 나른하고 졸리다. 운전하는 아줌마도 졸음과 싸우는 듯 보여서 옆에 앉은 남편이 좀 불안해서 말도 시켜보았다고 한다. 90도 불볕이었다가 40도 이하의 손 시린 추위가 널뛰는 가운데, 가만히 있고 싶은 게으른 몸을 채찍질하면서 이 거대한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주 살짝 맛보고 있다고 느껴진다.
Day-30, 낙오했어도 난 행복할 거다
예정대로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고양이 세수하고, 7시에 근처 Visitor center 출발하는 첫 셔틀로, Logan pass에 위치한 trail head로 가기 위해 캠프를 나선다. 45도의 쌀쌀한 아침이다.
부지런히 셔틀 정류장에 6시 40분쯤 도착하니 벌써 줄 서 있는 더 부지런한 젊은 하이커들. 12명 타는 직행 셔틀 두 대 보내고 3번째 셔틀을 7시 30분에 겨우 얻어탄다. 벤츠 제품 봉고차에 타고, 준비해온 간단한 아침을 커피도 없이 꾸역꾸역 먹으며 한 시간 넘게 걸려 Logan pass에 도착한다. 아침에 뜨거운 커피도 못 마셔서 그런가 계속 몸에 한기가 돈다.
햇살은 벌써 눈부셔서 하이킹하기 딱 좋은 날씨... 그리고 높은 산자락을 자르며 걷는 Highland trail로 접어든다.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안 해도 되는 착한 길이 조금 열리다가... 으악, 차 타고 보면서도 아찔하던 까마득한 계곡이 한눈에 펼쳐진다. 그 순간 Yellowstone 폭포에 내려가며 느꼈던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며 다리가 굳어버린다. 길이 험한 것도 아닌데, 시각적인 공포로 그곳을 더는 걸어갈 수가 없다.
계곡으로부터 몸을 돌리고, 단호하게 난 더는 못 간다고 선언한다. 당황한 남편이 달래고 얼러보지만, 저 아래를 안 보고 걸어갈 바엔 12마일을 걸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체력에 무리도 안 좋지만 정서적인 무리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니, 여기서 돌아서는 것 말고 다른 옵션은 선택할 능력이 없다.
이곳에 오기를 학수고대한 남편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한 줌의 아쉬움도 없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면 아름다운지 알아도 못 가는 것과 같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수많은 하이커가 몰려가고 있으니 남편이 혼자 가도 곰이 공격할 경우의 수는 거의 zero일 듯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서워서 못 가는 심약함으로, 이 한 세상 오늘까지 살아온 내가 스스로 안쓰러워서 살짝 청승맞은 생각이 스며든다.

아침엔 모두 셔틀 타고 Logan pass로 올라가니, 내려오는 버스엔 나 혼자다. 아줌마 기사가 벌써 하이킹 끝냈니, 물어봐서 아래 내려다보니 너무 무서워 못 갔다고 하니 "I understand"라고 말해줘서 고맙다. 남편은, 무섭긴 뭐가 무섭냐며 한심해할지도 모르는데... 고통이 완전히 주관적이듯, 공포도 주관적인 느낌으로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 여행을 망설인 이유, 젊은 시절 서부의 자연을 보며 심장이 멈출 듯하던 그 무서움증이 30여 년 흘렀는데 여태 그 자리에 남아있다.
새벽에 차를 주차해놓은 visitor center로 돌아와,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village에 가서 따스한 햇볕 아래서 라떼도 홀짝이고 몬태나 물건들을 기웃거리니 아침 내내 얹혀있던 한기도 사라지고 편안하다. 캠프에 돌아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남편이 돌아와 혹시 길이 어긋날까봐 차를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니 시간은 늘 줄줄 잘도 흘러간다.
오늘은 드디어, 산불로 닫혀있던 Going to the sun road의 동쪽도 활짝 열렸다고 하니, 남편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주지 못하는 나 때문에 심드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기막힌 절경을 걸으며 감동의 도가니탕을 끓이는 것도 행복이겠지만(공포가 없다면), 몬태나의 하늘 아래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에겐 충분한 행복이다. 여기까지 와서 책 읽을 일 있냐는 주장엔 할 말이 없지만...
오후 4시 30분쯤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남편... 내가 안 가길 잘했노라고, 그러나 어마어마한 view가 계속되었노라고 말해준다. 내가 안 가서, 혼자서 더 어마무시한 깔딱고개를 올라가 continental divide까지 올라가 미대륙의 동서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와서 매우 흡족해한다.
단지 하이킹에서 만난 더 연장자인 부부가 그런 건 동네 앞마당인 듯 휘젓고 날아다니는 거 보고 기죽어서, 하이킹 좀 하고 왔단 말 안 하기로 했단다. 여기 와보니, 산에서 날아다니는 노인들이 많아서 도전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위로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