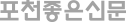Day-24, 8월 초하루는 이웃 나라 캐나다에서
오늘은 아침 7시 반에 타국을 향해 달리며 얼굴에 분칠도 하고, 호텔 커피숍에서 산 라떼도 홀짝이며 분주한 하루를 연다. 40여 분 먼지 나는 한적한 오지 같은 몬태나 땅을 달려 캐나다의 Alberta 주로 들어섰다. 여권 보여주고 통과한 산길을 1시간쯤 더 달려 캐나다 영토에 속하는 Glacier park에 도착했다. 미국에선 평생권을 끊어서 공짜로 드나들었는데, 입장료로 16불을 내고 캐나다 국립공원에 들어서니 영어와 프랑스어가 같이 쓰여 있는 표지판과, mile 대신 kilometer를 사용하는 등 여긴 딴 나라인 것이 맞다.
Visitor center에서 추천한 가벼운 하이킹으로 5마일짜리 산정호수에 오르며 아침 운동을 했다. 내가 들꽃을 보면 이성이 마비되듯이, 남편은 빙하에 열광한다. 수천 년 전에 얼음이 되어 오늘 존재하는 H2O의 거대한 실체가 신비로운 건 나도 이하 동문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바라본 빙하들은 미국 영토에 속한 것들이고, 이 공원 캐나다 땅엔 빙하가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1800년대 말 150개이던 빙하가 25개 남았고, 2020년엔 다 녹아버릴 거라고 하니, 한시적인 것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우리들의 fascination(매혹)에 한몫한다고 생각됐다.
하이킹하는 캐나다의 노부부들을 만나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두 커플씩 함께 다니는 걸 보니, 저분들은 노년에 필요한 세 가지, 친구와 물질과 건강을 다 가진 듯 보인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60 후반 내지 70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유쾌하고 친절하고 멋지고 건강해 보인다. 골프 안 치고도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며, 골프 배우라는 주위의 압력을 견디는 힘을 비축해간다.
알프스에서 보고 기죽던 스포츠 alpine running, 걷는 것도 힘든 산에서 뛰어다니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에서도 미국과 다른 풍경을 본다. 훨씬 athletic하고 날씬하던 유럽사람들의 모습이 미국보다 우월하게 보이던 유럽의 모습 중 하나이다.

점심은, 바람이 몹시 부는 언덕, 학생 때 읽은 소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생각나게 하는 절벽 위에 서 있는, 88년 된 호텔 Prince of Wales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먹었다. 건물은 스위스 샬레이고 분위기는 영국풍이고, 밴프의 루이지 호텔처럼 호수 전망 라운지에서 afternoon tea도 있다.
Tea time보다는 에너지 충전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줘야 할 것 같아서 우아한 tea time은 눈물 머금고 지나치고, dining room에서 pulled pork(돼지고기 푹 익혀서 잘게 찢은 요리) 같은 든든한 음식을 먹었다. 큰 컵에 얼음 띄운 물 대신, 이쁜 물병에 찬물을 주는 것부터가 여긴 미국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킨다. 얼음 넣은 물을 달라고 하려다가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 대신 시원한 맥주를 주문한다.
웨이터는 찰스 왕자 같은 치마를 입고 서브하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 밥값에 거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라, 여름 장사만 하는 호텔의 운영이 오히려 걱정된다.

미국은 국립공원으로 말뚝 박으면 그 안에서 일반인들이 살림을 살 수 없는 것과 달리, 여긴 등록된 주민 88명의 village가 있다. 이런 100명 미만의 정착지를 일컫는 말이, Hamlet인 것도 오늘 처음으로 배웠다.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스펠링이 같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의 반반 치킨 같다. 양념 반, 프라이 반!
Waterton이라고 명명된 이곳의 드넓은 호수를 유람하는 80년 된 배를 타고 건너가 보니 다시 몬태나 땅이다. 자동차로 캐나다로 달려왔더니 배가 다시 미국에 데려다 내려놓는다. 발목이 시리다 못해 아프도록 차가운 호숫물에서 탁족을 즐기고 다시 캐나다로 배를 타고 돌아온다. 북위 49도로 국경을 가른 지점엔, 호숫가 숲을 국경 따라 이발해 놓고 국경을 표시한다. 호숫물에서는 국경에 금을 그을 수가 없다.

보트 가이드가 배에서 내려 꼭 보고 가라고 한 Red rock canyon에 가보니 우이동 골짜기 같은 곳에 하얀 줄무늬 있는 빨간 바위들이 아름답게 계곡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빨간 바위를 가리니,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가 없다.

꼭 봐야 한다는 곳에 들르고, 우린 이미 거쳤으나 보트 가이드도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Prince of Wales 호텔 라운지에 다시 오니, 공짜 와이파이가 슝슝 돌아간다. 몬태나 촌구석과는 달리, 이 동네엔 와이파이 광케이블이 잘 깔려 있다는 증거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미국의 북단 몬태나는 오지에 속하지만, 거기 맞닿은 캐나다 최남단인 앨버타주는 이 나라 기준으로 요지에 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에밀리 브론테의 나라, 영국 분위기가 나는 호텔에서, 캐나다의 하루를 접는다.
Day-25, 가물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우리가 숙소로 정한 St. Mary는, 이 국립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유명한 산길, Going to the Sun road의 동쪽 입구이다. 그런데 산불이 바로 이 근처에서 아직도 연기를 올리며 타고 있어서 동쪽에서는 Going to the sun으로 진입이 안 되고 우리 캠프만 열려있다. 다음 일주일은 공원 바깥 길 3시간을 돌아서 서쪽으로 가서 그 유명한 길을 달려볼 예정이다.
아침나절, 근처에 있는 사설 캠프장으로 빨래하러 간다. 은퇴한 부부가 RV 끌고 동부에서 와서 캠프장에서 일하며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또 한 아저씨는 은퇴한 미국 해병대로 태국에 가서 걸린 말라리아가 아직도 몸속에 있어서 가끔 발병한다고 했다. 곤돌리자 라이스와 쌀을 싣고 북한에 갔던 얘기도 들려준다. 영어 할 줄 아는 젊은 여자 가이드가 붙어서 안내했는데, 엄청나게 사납고 불친절했다고 했다. 저런 북한을 두고 미군 떠나라고 데모하는 서울 용산기지 앞 젊은 애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죽은 아내가 이곳의 인디언들 상담자로 근무하게 되어 몬태나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다.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들의 역사는 여행을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곳은 요즘 이례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이 잦아들기 힘든 상태였다. 자연 현상이라고 관망만 하고 있고, 산불을 진화하던 과거는, 국립공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육식동물, 늑대 퓨마 이리 등을 싹 다 몰살시켰던 역사와 동급으로, 생태계를 모르던 무식한 흑역사 취급이다. 자연을 자연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사치스러울 수 있는, 먹고살 만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이곳의 날씨는 현재, 낮엔 85도 이상 오르고 해가 떨어지면 45도인데, Yellowstone에서 춥고 비 오고 우박까지 떨어지던 것에 비해서 양호하다. 다만, 하이킹하기엔 너무 더워서 이거저거 멋지다는 코스를 골라놓은 남편에게, 못 가겠다고 배 내밀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오늘도 주의 날이다. 아침 예배는 8시 30분이라 놓치고, 내일 아침 일찍 말타기로 한 동네, 숙소에서 한 시간 떨어진 Two medicine이라는 동네로 가서 6시 예배를 드렸다. 호텔에서 식당, 빨래방 등에서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예배 인도하는 국립공원 미션팀이다. 동전 한 잎을 찾아 헤매며, 길잃은 양을 찾아 헤매며, 돌아온 탕자를 맞으러 체통을 버리고 마구 달려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하는 여대생을 보며 미국의 디딤목을 본다.
내일 아침 서둘러서 달려오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이곳 캠프그라운드에서 유숙하기로 했다. 장막은 그대로 St. Mary에 두고 와서 타고 온 차에서 잘 예정이다.
이곳까지 데리고 온 내 꽃바구니는, 날씨 험한 Yellowstone에서 나처럼 주눅 들어 찌그러들어있는데, 집에 심어놓고 온 백일홍은 잘 피어 화려하게 내 정원을 장식하고 있다고 딸이 전해온다. 집이 그립다.
무거운 등짐을 메고 산을 오르듯 집도 그립고, 날씨도 덥거나 춥거나 한데, 내 집의 안락함을 집어던지고 계속되는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며 긴 여정을 감당해 간다.
Day-26, 말 타고 몬태나의 먼지 나는 땅을 바라보다
낮엔 90도 가까이 오르지만, 아침은 쌀쌀하다. 예약된 말 타는 장소로 가는 길에 아침햇살을 받아 호수에 잠긴 산과 나무를 잠시 만나 아침 인사를 건네고 East Glacier 마을로 간다.

Two medicine은 인디언들이 강변에 두 개의 medicine lodge(약방)를 지어놓고, 만남의 장소와 환자들을 치유하는 장소로 사용해온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곳엔 캠핑장 말고는 아무런 상업적인 업소가 없다. 20분 떨어진 작은 마을, 유서 깊은 호텔과 작은 모텔들이 여름 한 철 장사하는 곳이 East Glacier란 주소의 작은 마을이다. 고등학교는 없고 8학년까지만 있다 하니, 인구는 불과 수백 명인 듯하다. 인구가 1천 명은 되어야 고등학교가 있는 듯하다.

9시 30분에 인디언 추장의 후예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목장으로 가니, 주인장이 가족의 역사를 옛날 얘기하듯 손님들에게 해주고 있었다. 주인마님도 추장의 손녀이고 남편의 인디언 이름, Many horses를 상징하는 무늬의 구슬로 딸이 만들어준 조끼,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Dances with the wolf에 인디언으로 출연한 조카 등의 얘깃거리가 끝이 없었다.

마약에 찌들지 않고 카우보이로 명성을 날리는 추장의 후예와 그 자손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잘 훈련된 영리한 말을 타고 먼지 풀풀 나는 몬태나 땅을 밟아본다.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 용사 같은 청년 둘이 계속 자기 부족 Blackfeet 역사 등을 이야기해주었다. 몬태나에서 태어나 이곳을 벗어나 본 적 없다는 가이드와 이 집 사위인 백인 아저씨의 몬태나 수다는 두 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오면서 본 작은 마을 Augusta 출신인데, 거기 고등학교 8등으로 졸업했다고 한다. 졸업생 9명 중에서. 옆 동네 Choteau 출신 David Letterman이 고향에 큰 목장을 사들였다고도 하고, 브래드 피트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카지노 Lolo hot springs도 아직도 존재한다는 등, 몬태나의 깊은 속살을 재미있고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말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려다본 몬태나의 장엄한 아름다움의 감동이 오랜 여행으로 지치려던 몸과 맘을 스르르 치유해주었다. 말을 두 시간 반 동안 타고난 내 다리의 근육은 내 발로 걸은 것보다 더 피곤하지만, 먼지를 함빡 뒤집어썼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체험이었다. 특히, 몬태나주 깃발에도 상징으로 그려져 있는 인디언들 후예들과 두 시간을 같이 지내며 많은 대화 나눈 것이 제일 흡족하게 기억될 것 같았다.

▲말 탄 사진을 친구가 뽀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
점심은 와이파이 잘되는 우리 마을 카페에서 먹었다. 60년대 스타일 인테리어의 시골 촌 식당인데, 홈메이드 같은 미국 음식이 엄청 맛있었다. 낮엔 더워서 하이킹을 안 하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으니, 이제 빈둥거릴 일만 남았다.
난 몬태나의 big sky가 참 좋다.
Day-27 Glacier national park 오늘 드디어 만나다
어제 오후는 불볕더위였다. 달리는 차 안에 있어야 그나마 시원하니까 근처의 읍내에 해당하는 Browning으로 나가봤다. 인구 1천여 명의 이 마을은 주민의 대다수가 인디언들이다. 얼음 사러 상점에 들러보니 점원도 손님들도 모두 인디언들이다.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겐 의과대학 학비로 짊어진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 들은 것 같다.
해가 넘어가면 금세 시원함을 넘어 좀 으슬거리는 저녁이 오고, 캠프로 와서 느긋하게 쉬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난 남편이, 뒷자리에서 뭉그적대는 나를 싣고 Many Glacier로 달린다. 어제 말 타고나서 안 쓰던 근육들이 불편하다고 외치는지라 오늘도 게을러지고 싶은데, 예까지 운전하고 오신 분이 가자면 가는 거다.
가이드 책에서 꼭 가보라고 한, 왕복 10마일짜리 트레일, 낮엔 덥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할 테니 새벽반으로 뛰겠다는 거다. 못 가겠다고 할 명분이 없어 끌려가지만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인기 있는 트레일이라 주차도 힘들다는 동네지만 시간이 이른 새벽이라 주차할 곳도 확보했고, 그곳 호텔 화장실에서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떠난다.
아침이라 시원하기도 하지만 먹구름이 가득하여, 여태 건조하던 이 동네가 오늘 날 잡고 비를 쏟는 거 아닌가 불안하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브래드 피드의 "넘치는" 동생이 부담스러운 표정 연기가 특히 훌륭하다고 느꼈는데, 오늘 아침은 나도 넘치는 남편이 부담스럽다.
여행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거 하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열정이, 따라가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다. 너무 건강해서 나보다 힘이 넘치는 노인이어서 부담스럽고, 너무나 똘똘해서 머리가 팽팽 돌고 있는 사람 옆에서 부담스럽다. 아픈 사람 병시중하고, 부족한 사람 시중드는 것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걸 모두 경험해 봤으리라.
고도 6,000피트의 호수까지, 5마일을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빨리 끝내버리려고 8282 정신으로 거의 뛰다시피 걸었더니 1시간 만에 3마일 가까이 주파해 버렸다. 그리고, 반 조금 지난 지점에서 만난 폭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마일의 트레일은 너무 아름다워서, 새벽부터 설치며 부담스럽던 남편의 극성마저 싹 다 잊혀버렸다.

바위도 아름답고, 성채 같은 봉우리들도 아름답고,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는 계곡도 벅차고, 호수를 향해 펼쳐진 야생화 정원은 티탄에 꼭 박아두려던 내 사랑을 뒤집고 엎어버린다. 이 동네 Indian paint brush는 아래쪽에선 오렌지빛을 머금고, 위로 올라와 호수 가까이 오니 짙은 mauve color로 피고 있다. 와이오밍에선 크리스챤 디오르의 빨간 매니큐어 색이었는데, 노랑과 보라의 야생화 정원에서 눈부신 focal point로 존재한다.

그리고 주차장 떠난 지 2시간 만에 만난 빙하호수. 빙하가 깎아놓은 작품, 아름다운 270도 바위 성채에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 아침햇살에 데칼코마니로 아름다움을 빛내더니 해가 높아지자 빙산을 띤 에메랄드빛으로 찬란하게 물빛을 펼친다.

달력에서 보던 바로 그 Glacier national park였다. 발품을 팔아야, 살짝 보여주는 비경!! 티탄의 Solitude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재빨리 인기 순위가 바뀌었다.
얼음이 떠다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차갑게 보이지만, 호수의 물은 가져간 생수를 잠시 담가놓아도 냉장고에서 나온 물 같았다.
What have I done to deserve it? 오늘 이 아름다운 호수에 걸어 올라와서 이 경치를 보고 갈 수 있는 축복에 감사했다. 지난 5월 말에 함께 저녁 먹으려고 초대했는데 내가 심신미약으로 취소해서 못 만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딸을 통해 들었다.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때도 이 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무리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 기회를 놓쳤었다.
우리가 이생에 있는 시간이 잠시이고, 올라가며 아름다운 계곡도 보고 폭포도 보지만 여전히 헉헉대며 걸어가다가, 호수에 가서 감동하고 쉬는 시간은 잠시이다. 내려오는 길도 만만치 않다. 말 타느라 놀랜 근육을 지탱하며 힘든 고행길 빨리 끝내려고 앞만 보고 부지런히 내려왔으니.
먼지 뒤집어쓰고 산에서 내려와, 어제 목장집 사위가 추천한 유서 깊은 동네 식당으로 가서 몬태나 스테이크로 점심을 먹는다. 시골 식당이지만, 내가 우리 정원에 가져다 놓고 싶어 하는 마차마퀴와 꽃바구니,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 장식이 내 맘에 쏙 들었다. [계속]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가 못 들어온 먼지 가득한 몬태나. 나는 이곳이 참 정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