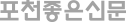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티탄으로 가는 길에 성채처럼 솟아있는 자연의 위용.
Day-6, Keep Wyoming Wild
지금도 여전히 서부시대로 살아가는 와이오밍주
Riverton의 숙소를 아침 8시에 출발, 세 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scenic drive를 달려 Grand Teton으로 향한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드문 아름다운 황무지가 펼쳐지자, 여기까지 달려온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고속도로에서도 가끔 보이던 캐슬이 떠오르면서, 자연이 세운 아름다운 성채 같은 풍경들을 감상한다. 니들이 castle이 뭔지 알어? 라고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 듯, 우뚝 솟아있는 자연의 건축물이 장대하고 아름답다.
먼지 속에서 죽을 고생 하며 서부로 가던 개척자들은 이 경치가 아름답다기보다 넘어야 할 고난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상상해본다.
2시간쯤 달리니 Duboise라는 이름의, 서부영화 세트장 같은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인구 900여 명 사는 이마을의 원래 이름은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Never sweat(땀이 안 나는 마을)이라고 불렸다. 우체국이 세워지며, 그 이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 그 당시 아이오와 상원의원을 지낸 프랑스계 Dubois의 성을 따라 마을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란서식 발음 뒤브아라고 부르긴 싫다고, 두보이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예술가들이 모여 산다는 작은 마을 두보이스.
이곳은 아름다운 경관과 외진 위치로 인하여 작가, 미술가, 작곡가 등 예술가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이룬다고 한다. 겨울엔 -36F(영하 37C)까지 내려간다는데 예술의 영감도 꽁꽁 얼어붙는건 아닐까? 얼어붙는 자연이 감성의 또 다른 옥타브를 연주할 수도 있겠지.
두보이스를 지나 꽃다발로 만들어도 될 듯한 색색의 야생화들과 쭉 뻗은 기럭지를 자랑하는 침엽수림이 어우러진 비경의 continental divide(미대륙을 동서로 나누는 지점)를 넘어서니, 멀리서 Grand Teton이 보인다.
제일 먼저 국립공원으로 올라간, 대단하기 짝이 없는 Yellow stone 바로 옆집이란 이유로 이 아름답고 웅장한 산은 그저 동네 산으로 남아 있을 뻔했다.
그러나 Albright라는 Visionary leader가 Yellowstone 국립공원 책임자로 있으면서 티탄도 후세를 위해 그 자연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멋진 부자 록펠러를 설득하였다. PT를 엄청나게 잘했는지, 그에게 설득된 록펠러는 주변의 땅을 야금야금 사들여서 개발을 막고, 연방정부에게 그 땅 다 줄 테니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등재해달라고 강력히 밀어부쳐 오늘날 우리도,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야생의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거다.
Teton은 여성의 유두를 가르치는 비속어 teat의 프랑스 말이라고 한다. 이곳을 탐험하던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 불린 이름이라는데, 그러고 보면 그리 보이는것도 같다. Teton은 그 규모도 국립공원으론 소규모이고 제일 높은 봉우리의 높이도 13,000피트(3,900미터) 정도라, fourteener라 불리는 콜로라도 로키의 기라성같은 14,000피트가 넘는 봉우리들에 비하여 그 위용은 밀리지만, 청명하고 드넓은 호수로부터 바로 치솟아 오른 아름다움이 차별화된 Teton의 가치라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메인주의 꽃 Lupin을 비롯한 야생화가 한참이라, 야생화 도감을 Visitor center에서 구입했다. 이름을 알아가며 야생화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이 공원에 관한 기록영화를 보여준 후, Screen이 걷히며 커튼이 쫘악 올라가고, Teton이 사진처럼 내다보이는 유리창으로 마무리하는 visitor center의 세련된 감각에도 박수를 보낸다.

▲티탄의 Visitor CENTER의 공원소개 영상이 끝난 후 스크린이 올라간 자리의 창문.
이곳에서는 캠프장이 예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디서 묵는 것이 제일 탁월한 선택인 걸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곳을 확보할 수 있나 하면서 남편과 둘이서 머리 바삐 굴리며 작전회의를 했다.
우선 오늘 밤은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자리 확보가 수월한 캠프장에서 묵기로 했다. 이 캠프장도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침엽수들 가운데 자리 잡은 충분히 훌륭한 곳인데,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겠다고 이사씩이나 갈 예정이다. 캠핑와서도 점진적인 주거환경 업그레이드...욕심일까 바지런함일까... 중단없는 전진의 구호 아래 성장해온지라, 어디를 가나 성장배경이 버무려진 DNA가 춤춘다.
숙소 문제 결정 후, 와이오밍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 Jackson hole로 마실 나간다. 두보이스와 비슷하지만 훨씬 규모가 큰 서부영화 세트장 같은 마을이다. 높은 산자락으로 둘려싸인 가운데 뻥 뚫린 구멍, hole을 연상케 하는 지형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Canada Banff의 작은 버전이라고도 생각된다. 즐비한 갤러리들과 이 동네 부자들을 겨냥한듯한 비싼 물건들을 감각 있게 진열된 가게들을 구경하며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

▲와이오밍 부자 동네 잭슨홀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
수년 전 가이드 따라온 여행 당시에 들렀을 때도 인상깊었던 곳이다. 그땐 단체여행인지라 허름한 식당에서 질긴 스테이크를 먹은 기억이 있어서, 이곳 Visitor center에서 어디 가면 젤 맛있는 와이오밍 고길 먹을까 물어본다. 그곳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준 Gun barrel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스테이크의 품질, 양념, 구운 솜씨, 그리고 카우보이들이 드나들 것 같은 야생적인 인테리어까지, 만족도 최고였다. 낯선 동네에 가면 visitor center를 열심히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마을 한복판에선 동네 극장 소속 젊은 배우들이 서부극을 한마당 펼치며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그들이 외친 말, We want to keep Wyoming wild.... 발전과 개발을 지향하는 대신, 자연과 옛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면 더 높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도 당장 먹고살 일로 아등바등하는 동안에는 여유이며 사치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야생과 전통문화가 낯설지 않고, 깊숙하게 즐기게 된 걸 보니 내가 이 나라에서 산 세월이 길긴 길었던 듯 하다.
캠프장에 있는 세탁실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정보를 입수, 오늘도 하루를 기록에 남기고 접게 되어 기쁘다.
Day-7,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제 짧지만 매우 강도 높은 작전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은 이사하는 날. 칠흑 같은 완전한 어둠과 침엽수림 속의 깊은 적막 가운데 숙면을 취하고 비가 부슬거리는 아침을 맞았다. 남편이 여행 계획하며 research한 정보에 의하면, 이 국립공원의 꽃은 Jenny lake라서, 그 옆에 있는 소규모 캠프장(30자리밖에 없는)을 제1 지망으로 삼았으나, 1주일 있기엔 부대시설이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되었다.
Jenny lake는 이곳 최고의 prestigious address(번역하면, 상류층 주소… 미국에서도 어느 동네의 주민인가로 사회적인 지위를 말해준다)라고 보면 된다. 5 course meal이 serve 되고 자킷 입어야 하는 식당을 갖춘 가장 비싼 숙박업소도 이곳에 있다.
Jenny lake camp ground에서는 학군 좋은 부자 동네에 끼어 살겠다고, 젊은 시절 작고 오래된 집에서 애들과 살았던 기억이 났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공인된 Jenny lake에서 조금 운전해 가서, 바다 같은 호수 Jackson lake 곁, 국립공원 소속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호텔의 일부인 Signal mountain lodge and camp site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다.

▲제니 호숫가의 최고급 호텔은 이런 모습이다. 실내는 고급이지만 겉모습은 자연속에 숨어있는 미국식 정서. 식사 포함 하룻밤 숙박비 700여 불 정도다.
아침 눈뜨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오니 전기도 있고, 호수가 바라보이는 dream house 급의 camp site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호수가 보이는 집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치품일 거다.
집을 세운 후 비가 줄줄 내려서, 호텔 로비로 왔다. 캠프장에 묵어도 호텔 투숙객이니 와서 로비를 즐기라고 말해주는 친절함. 호수를 바라보는 운치있는 전망의 라운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주일 내내 빈둥대도 충분히 좋을듯싶은 쾌적한 환경이다. 이제 호텔 생활 접는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호텔의 안락함을 즐기게 생겼다.

▲우리가 일주일 살 호숫가 집. 식당만 설치하고 잠은 차에서 잤다.

▲제니호수를 걸으며.
비가 그칠 때까지 로비에서 커피도 홀짝이고 노닥거리다가 해가 나자 다시 캠프로 가서 이른 점심을 먹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라는 Jenny lake 일주에 나섰다. 하늘을 향해 곧게 올라간 잘생긴 pine tree들이 흩뿌리는 파인 향, 순전한 물이 찰랑이는 청명한 호수, 잔치 벌이고 있는 오만가지 야생화들을 즐기며 7마일(11km)의 호수 주변을 걸었다.
나의 작은 정원의 꽃들과 끈적한 작별을 하고 떠나왔는데, 이곳에 오니 장대한 하나님 정원의 훨씬 더 많은 꽃이 나를 반겨준다. 인생의 한 chapter가 막을 내렸다고 너무 오래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다. 마지막 장이 덮어지면 천국으로 옮겨 갈 텐데, 한 장 한 장 덮어질 때마다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던 걸 돌아본다.
도감을 펼쳐가며 수많은 야생화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계속 사진 찍으며 걸었다. 아름다운 호숫가 야생화들의 축제 가운데에서, 몰래 단풍이 들고 있는 잎들도 꽃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환상의 trail이었다. 접시꽃, Lupin 등의 야생 버전들을 보게 되는데 정원의 개량종들보다 꽃의 크기가 작다.
오늘 본 그 많은 야생화 중 꽃이 커다란 애들은 하나도 없다. 멀리서 지나가며 흘깃 보면 보이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detail들을 그 작은 꽃들이 품고 있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발견하며 창조주의 작품세계를 본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저리 이쁘게 피고 지는가.. 아니지, 쟤들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분께서 구석구석 다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들에 핀 꽃들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닿으니, 신비롭게 느껴지는 pine 숲길에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온다. 그 광대하고 detail 한 사랑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니, 경이로운 자연 가운데 생생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내 안에 자유로움이 스며든다.
숲길에서 만난 한 백인 아저씨가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다. 아는 대로 설명해주니, 물을 안 가져 와서 내일 가야겠다고 한다. 내가 남편 배낭에 있는 물을 줄까? 하니 고맙다며 받아들고 간다. 그동안 이 나라에 살며, 내가 유럽인의 후예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품고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선심 쓴 물 한 병이 나에게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 찍을 꽃이 많아서 좀 지체된 3시간 남짓의 trail을 마치고 visitor center로 돌아오니 황소만한 elk가 풀을 뜯고, 사람들은 조용히 둘러서서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본다.
Trail 동안 최적의 날씨가 이어지더니 우리가 돌아오니 천둥번개로 시작된 비가 다시 내린다. 호텔 로비로 돌아와 안락하고 쾌적한 곳에서 오늘을 기록하고 또 하루를 덮는다. <계속>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워싱턴DC에서 김은성 드림

▲우리가 묵은 캠프장은 이 호텔 소속이라서 투숙객처럼 로비를 이용하며, 인터넷도 쓰고 호수를 내다보는 최고의 경관과 함께 무한 제공되는 공짜 커피도 마셨다. 최고의 주거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