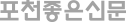D-day, 7월 9일 2015년, 펜실베니아
D-day는 군사용어로 작전 결행의 날이다. 역사적으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가장 센 유명세를 가진 D-day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작전을 결행하고 드디어 긴 여정을 나섰다. 거의 두 달간의 여행을 위해 의식주와 오락거리까지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군사 작전급이었다. 막상 워싱턴DC의 집을 떠나 북으로 운전하며 자동차 dash board에서 좔좔 하강 중인 바깥 기온을 보니 성공리에 진행 중인 작전인 것 같았다.
우리 동네는 오늘 90도라고 기상예보에서 들었는데, 오늘 숙박할 오하이오 털리도는 67도였다. 무려 450마일, 7시간을 달렸다. Maryland, Pennsylvania, Ohio로 달리는 동안은 주위에는 푸른 초장과 Alleghany mountain 푸른 숲만 내내 이어졌다.
고속도로변 휴게소에서 맥반석 오징어, 닭꼬치, 비빔 국시를 먹어줬음 좋았겠지만, 허접한 햄버거로 허기를 때우고 숙소에 도착하여 집에서 챙겨온 밑반찬에 누룽지를 전자 오븐에 끓여 먹으니 너무 행복하다. 제주도에서 친구가 가져다준 김자반, 내 텃밭에서 따온 풋고추, 볶은 고추장, 오이, 아보카도, 멸치볶음 등등. 벌써 집밥의 위력이 행복지수에 이바지하고 있다.
집에서 데리고 온 꽃바구니 두 개를 오늘 잘 달려준 우리 차 지붕 위에 모셔 놓고 숙소로 들어왔다. 아침 이슬 맞으시라고.

▲7시간을 잘 달려준 우리 차가 여행의 동반자로 데리고 온 꽃바구니를 지붕에 이고 휴식 중이다.
Day-2, 7월 10일 '바람의 도시' 시카고
바람의 도시라고 불리는 시카고로 왔다. Chicago는 인디언들 언어로 야생마늘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도시명이다. 오하이오주에서 아침 8시 30분에 떠나서 인디애나를 거쳐 4시간을 달렸는데, time zone이 바뀌면서 11시 30분 도착했다. 분명히 써버린 1시간을 돌려 주다니 수지맞은 느낌이다. 이렇게 동쪽으로 마냥 가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상상도 해본다.
Allegheny 산맥 너머에 펼쳐진 중부의 대평원. 달리는 내내 지평선과 맞닿는 데까지 펼쳐진 초록색 농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바다인 듯 바다 아닌, 바다 같은 호수. 5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 호수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으로 쾌적한 시카고의 여름 날씨가 불볕 동네에서 온 우릴 와락 반겨준다. 이런 날씨엔 건축가들의 재능 격돌 무대인 우아한 이 도시가 아니라도 마냥 걷고 싶을 것 같다.
1871년의 대화재로 도시의 대부분이 타버린 후 재건되면서 현대 건축가들의 갤러리가 된 듯한 거리에, 예사롭지 않은 마천루들이 즐비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바로 옆에 미시간 호수가 없었다면, 시카고의 아름다움은 반 토막이었을 것 같다. 인간의 위대함을 다 품고, 덮고도 남는 자연의 위대함. 시카고의 랜드마크인 Willis tower 103층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내려다 본 시카고는, 평평하게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의 LA를 연상케도 한다.
마천루 사이로 강물이 운하처럼 흐르고, 예술작품 급의 현대 미술사적 건축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다. 굳이 등수 먹인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이은 2등. 뉴욕 다음가는 규모의 도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이 도시의 또 다른 이름, Second city는 나에겐 미학적인 근거로 그러하다. 유리 바닥 전망대에서는 내려다보니 너무 아찔해서, 겨우 표정 관리하며 사진을 찍고는 얼른 나왔다.
법적인 이름이 Sears tower에서 Willis tower로 바뀐 지 수년 되는데, 아무도 그리 불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요즘 하락세인 Sears, 그래도 미국 서민들에게는 향수 속의 이름이다. 이 빌딩에 사무실을 제일 많이 세 들어온 회사라고 이름까지 거머쥔 건 나뿐 아니라 모두 씁쓸해한다. Sears는 사업으로 밀렸어도 이 건물 지어 팔아서 부동산으론 재미 본 거 아닐까?
건축물의 꽃인 조경에도 심하게 공들인 흔적이 어디나 느껴지고, 금싸라기 땅 조각에 여유롭게 펼쳐진 조경 가운데 놓여있는 Adirondack Chair에 앉아 시카고의 바람과 문화를 잠시 음미해보았다. 이 순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조경을 즐길 수 있게 허락해주는 날씨이니, 이 또한 자연의 압승이다.

▲예술적인 건축물들이 호숫가에 전시된 듯한, 갤러리같은 도시가 시카고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의 바람을 음미해 보았다.
Day-3, 7월 11일, America's heartland 중서부의 대평원을 달리다
Time zone이 바뀌며 공짜로 번듯했던 1시간은, 이곳 시간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서, 시차로 인해 몸의 리듬이 깨지고 있음을 인지함으로 금세 값을 치른다. 세련된 도시 시카고에서 한 시간 서쪽으로 달려 유숙한 Ottawa, Illinois. 그 아름다운 도시가 꿈이었나 싶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방 창문을 여니, 금술을 드러내며 익어가고 있는 옥수수밭만 보인다.
두어 개 따다가 마이크로 오븐에 구워 먹고 싶어진다. 옥수수 서리라고 정겹게 불러주는 표현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건데,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흐릿해질 수도 있는 '남의 것'이다. 한국 정서의 장점이기도 한 융통성은 도덕과 윤리에 많은 구김살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리노이를 달려서 다리 하나 건너니, 아이오와. 서쪽으로부터 시카고를 향해 동진 중이라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오다가, Walcott라는 마을에서 주유할 겸 들른 휴게소. '할머니의 부엌'이란 이름의 식당에 들어서니 미국의 전형적인 시골 스타일 인테리어의 식당이다. 시골스럽지만 촌스럽거나 저급하지 않은, 잘 어우러진 색감의 벽지와 감각 있는 데코들이 아주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미국 중서부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수준급 스타일이라고 평하고 싶다.
천장의 샹들리에도 tea pot으로 만들었고, 가정집에서 쓸 거 같은 참나무 의자와 테이블로 꾸며져 있다. 서빙하는 금발 아가씨들 포함, 이곳에서 백인 아닌 인간은 우리뿐이다. 이 땅을 개척해낸 유럽인들의 후예, 'American heartland, 미국의 심장부'에 와있다는 것을 확인사살 중이다.
이런 곳에서 만나고 싶은 home made 시골 음식은 기대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훌륭한 음식이 저렴하게 제공되었다. 깡통을 따서 이거저거 부어서 적당히 만든 음식이 아닌, 신선한 재료로 이곳 부엌에서 다듬어서 칼질하고 구웠다고 느껴지는 정겨운 음식으로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점심 한 끼를 즐길 수 있었다.
남편은 아이오와 폭찹이라고 쓰인 돼지고기를 시켰는데 여태껏 먹어본 돼지고기 중 최고라고 느꼈다. 난 매콤하고 덜 느끼해서 한식 대체 식량으로 먹게 되는 타코 샐러드를 시켰는데, 고기도 야채도 또띠야 껍질도 신선하고 맛있었다. 이 시골에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이었다.
아이오와주 전체 인구가 3백여만 명인데, 주 행정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 Des Moines는 인구 20여만 명이 산다고 하여 잠시 들렀다. 프랑스식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처를 흐르는 강의 이름을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랬겠지?) 프랑스에 흐르는 강 Des Moines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수도승들의 강'이라는 뜻이다. 굵직한 보험회사들이 많다는데 다운타운 규모는 장난 수준이고, 미국 대통령 후보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로 유명세를 타는 도시인데도 토요일인 것을 고려해도 sleepy town으로 보인다.
경관으로 봐서 이 동네는 농업국일 것 같은데, 농업은 산업의 5% 미만이고, 뜻밖에도 식품 가공업을 비롯한 공업이 수입의 주를 이룬다고 한다. 끝도 없는 농토에서 마구 쏟아지는 농산물은 큰돈이 안 되는가 보다. 시카고가 환상의 여름 날씨를 가진 나라였다면, 이 동넨 우리 동네 같은 현실적인 여름 날씨인 화씨 90도에 가깝다.
존 웨인이 De Soto라는 동네 출신이고 후버, 레이건 대통령이 아이오와 출신임을 자랑하고 있다. 방금 지나온 일리노이주도, 링컨과 오바마가 자기 동네 출신이라며 곳곳에 자랑하고 있었다. Des Moines에서 출발하여 두어 시간 더, 합이 7시간을 운전하니 네브래스카주가 되고, 인구 40만의 워렌 버핏이 사는 동네, 이 주에서 제일 크다는 도시, 오마하가 나타난다.
얼마 전 인상 깊게 본 영화, Nebraska를 다시 떠올리며 이런 곳에 와볼까 싶은 동네로 진입한다. 미국 백인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무식한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던, 코믹 톤의 영화였다. 오스카엔 6개 부분 후보로 올랐고 칸에선 남우주연상을 받은 수작이다.
북쪽인데도 90도 불볕더위에, 겨울은 엄동설한이고 폭풍과 토네이도 등으로 악명높은 기후 조건의 동네에서 무슨 맛에 살까 싶은데, 거부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도 50년 이상 같은 집에서 "perfectly happily" 사는 동네라고 한다. 낳고 자란 고향의 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살만하도록 골고루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여긴 초장이 많아서 축산업이 주를 이룬다니, 그건 동네의 생긴 값을 하는 통계라고 생각된다. 아이오와에서도 맛있는 고기 포식하고 와서, 네브래스카 고기를 먹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이오와나 네브래스카는 보수적인 중서부의 정치 성향으로, 리더들이 공화당 일색이다. 독일계 이민자가 주를 이룬다는 이곳은, 대도시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들만의 리그'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이라고도 생각된다.

▲미중부에서 만나볼 듯한 시골식당.

▲차주전자로 만든 샹들리에가 인상적인 식당의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