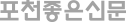최근 한국도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됐다. 올해 초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 발생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2월 7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전세계에서 무려 6천6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힘들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녔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여행 관련 산업은 거의 모두 부도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필자 김은성은 5년 전 2015년 7월 미대륙 자동차 횡단 여행을 떠났고 7주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꿈꾸는 '미대륙 횡단여행'. 포천좋은신문은 오늘부터 약 10회에 걸쳐 김은성의 '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기'를 싣는다. 상상에서나마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이 글을 연재하는 이유의 하나다. [편집자 주]

▲필자가 워싱턴DC를 출발해 7주만에 '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을 다녀온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여행 전문가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들로 세계의 여러 명승지를 들면서, '미국 자동차 여행'을 그중에 하나로 꼽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특별한 목적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저 자동차로 미국을 쏘다녀보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고속도로 아닌 국도로만 종단과 횡단을 해본 경험이 있고, 유럽에서도 자동차로 여행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그 나라를 제일 잘 느끼고 체험하는 여행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러시아나 캐나다는 영토의 넓이로는 미국을 앞서지만, 그 두 나라에 동토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개발되고 사람들이 주거하는 면적으로는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을 동서로 횡단하면 비행기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뉴욕에서 영국에 가는 시간과 비슷하다. 국내선이라 생각하고 비행하면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지곤 한다.
그런 광활한 땅을 자동차로 여행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짜릿하다. 물론 물류 수송으로 오가는 전문 운전기사들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과로의 상징인 거리일 것이다. 그분들도 똑같은 길을 여행으로 나서면 아마도 다른 느낌일 것 같기는 하다.
젊은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동부로 이사 올 때 자동차로 유명한 국립공원들을 들러보며 왔으나 그 여정은 순수한 여행 목적은 아니었다. 은퇴 후에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국 땅을 자동차로 밟아보는 7주간의 여행을 결행해 볼 수 있었다.
워싱턴DC 출발, 시카고 찍고, 티탄, 옐로우스톤, 글리시어 국립공원을 들러 캐나다 로키까지 갔다가 돌아온 대장정. 여행 중에 매일 써놓은 여행기는, 읽어볼 때마다 다시 그곳에 새롭게 가보는 느낌을 준다. 문서로 남긴 기록의 힘을 절감하게 된다. 여행길이 막혀있는 요즘, 독자들과 나의 여행기를 나누며 함께 활자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한다.

▲7주간 입어줄 의류.
7월 8일 D-1day 여행을 떠나기 전날
한동안은, 섭씨 26도 정도에서 살랑대는 시원한 날씨가 우리 동네에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쾌적한 집을 떠나 왜 길바닥에서 헤매고 다니겠다는 거지? 이런 쾌적함을 두고, 험한 길이 될지 모를 긴 여행을 떠나는 게 손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본색을 드러낸 이곳의 여름이 90도(섭씨 32도)를 넘기며 며칠 계속되다 보니, 밖에서 5분을 견디기 힘든, 뜨거운 이 여름으로부터 탈출하려고 결행 날짜를 이때쯤으로 정한 거였는데, 우리 동네 여름의 불볕더위의 엄청남을 잠시 잊었던 것임을 자각한다.
이번 여행이 이렇게 얄팍하게 상황에 좌지우지하며 초심이 흔들리기 다반사인 나의 정신세계의 치유 내지는 깊이를 더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챙긴다.
이런저런, 형상 없는 바램을 머리 속으로 챙기면서, 몸으로는 7주간 살아갈 준비물을 챙긴다. 짐을 되도록 적게 가지고 가자는 남편의 눈치를 봐가면서, 주섬주섬 4계절 날씨를 책임질 옷들 몇 점만 챙겼더니 더블백 한 개 반.
작은 가방은 남편과 같이 쓰고 남편 옷 한 가방을 더 쌀 예정이다. 7주 동안 입고 살 옷이 비교적 가뿐해서 짐을 잘 싼 거 같아 뿌듯한데, 여행 중엔 막상 입을만한 건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먹잘 것이 별로 없는 미국의 시골에서 헤매기 위해 나설 땐 간단히 끼니 때울 식량을 챙겨야 여행이 덜 고생스러운지라, 7주간 하루 한 끼 정도의 식량만 챙겨도 부피가 만만찮다. 모자랄 듯 가져가서 싹 다 소모하고 나머진 현지 조달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먼저 길을 떠나 여행 중인 선배가 남는 게 모자람보다 낫다고 훈수 두셔서 건조식량과 냉장 밑반찬 등 아무래도 넘치게 준비한듯하다.
준비 과정도 장황한 큰 과업이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여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한 끼 정도 집밥 비슷한 느낌으로 먹어줄 식량도 바리바리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