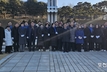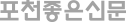몇 년 전 늦가을 너른 고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 갔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본성은 보수가 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길이 뜸한 동문 밖 한봉 외성은 보수가 되지 않았다. 한봉 외성은 흙과 큰 돌로 쌓고 다져서 성벽인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담장형식의 성가퀴를 둘렀다. 한 때는 오랑캐와 맞서는 옹골찬 방호 보루로 좌익문(동문)의 옹그린 요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처연하고 조악한 시절을 악다구니 하듯 버티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누가 나서서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가. 성벽 둔덕은 허투루 뭉그러지고 까무러진 곳에는 등산객이 다녀서 벼랑길이 생겨났다. 겨우 흔적만 남아있는 허물어진 성가퀴 언저리에는 고라니가 하르르한 고샅길을 내었다
나도 모르게 성가퀴와 나는 같은 운명임을 느끼었다. 순간 깊은 시름에 잠기었다. 나도 옹골차던 때가 있었다. 악다구니 하듯 버티며 힘차게 살아왔다. 성가퀴가 그러하듯 나이가 들어 결코 원하지 않았던 헐수할 수 없는 백수의 처지가 된 것이다. 갑자기 괜스레 심각하게 슬퍼지고 온 몸이 나른하게 기운이 쭉 까라진다. 멜랑콜리에 빠져버렸다.
석양에 수어장대(서장대)에 가까워질 때, 켜켜이 쌓인 낙엽 길을 허든허든 걸었다. 와삭이는 길섶소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였나 보다. 누가 뒤 따라 오는 것 같고, 쉬었던 자리에 두고 온 물건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작고 초라해지며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자꾸만 한참을 멀거니 뒤돌아보게 하였다.
사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마도 한봉 외성의 만추에 취해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버림받은 에고가 마음 한 구석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쓸데없이 뚫고 나와 드러난 나의 뒷모습은 아닐까?
나는 가을을 타는 남자다.

손대원
-포천문인협회 회원
-광주문학상 소설부문 신인문학상
-홍익대 사대 수학교육과 졸업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원광대 대학원(박사과정) 한국문학과 수료
-전 서울 광문고등학교 수학교사
-전 대전대 철학과 강사